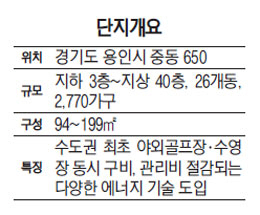|
|
구글의 래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과 KT 황창규 회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것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는 서비스 기업에서도 기술을 잘 아는 경영자란 매우 중요한 존재다.
물론 엔지니어 출신의 CEO들이 모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은 아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 한 우물을 파는 경향이 있어 실패 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성공한 기술, 실패한 기업'을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CEO들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소비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보유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을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와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는 빠른 학습력과 응용 능력만 있어도 선진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혁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존에 성공을 거둔 사업모델이라도 연이어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졌다. 따라서 기술인재들은 '직관'을 통해 시장의 흐름과 인간의 욕구를 읽어내는 능력까지 요구받게 됐다. 그래야 개발된 기술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인들이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MOT)'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이 기술 사업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MOT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등에 약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술경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기업 내 연구 인력의 사업화 역량 배양을 목표로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각 MOT 별로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거론하며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술 사업화는 창조경제를 앞당기는 열쇠이자 기술과 시장,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MOT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기술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이어져 기술 혁신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