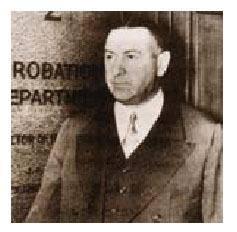|
‘그럴 리 없다.’ 미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리처드 휘트니(Richard Whitney)가 횡령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반응이다. 일반투자자들의 충격은 더 컸다. ‘목사가 십자가를 훔친 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휘트니는 뉴욕증시의 영웅으로 통했던 인물. 1929년 주가대폭락 당시 매장을 돌며 주요 종목을 1만주씩 사들이면서 하락을 방지하려고 애써 명성을 얻었다.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나 막대한 상속재산을 가진 여성과 결혼해 뉴욕 상류사회의 핵심인사로도 손꼽혔다. 하버드대학 선배인 루스벨트의 증시개혁에 ‘증권거래소는 완벽하다’고 맞서 거래소 회원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도 받았다. 명사였던 그는 왜 남의 돈에 손을 댔을까. 사치 탓이다. 미국의 1인당 평균 연간 국민소득이 700달러 남짓하던 시절에 한달 생활비로 5,000달러를 써댔으니 빚이 쌓여갔다. 휘트니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낌새에도 사람들은 JP모건 파트너였던 휘트니의 동생 조지 휘트니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결정적인 위기를 맞은 것은 1937년의 경제위기. 나아지는 듯했던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며 투자손실까지 발생해 부채가 2,400만달러로 불어나자 거래소 연금을 횡령하다 1937년 11월19일 내부고발로 꼬리가 밟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 요트클럽 공금과 장인의 재산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5년, 장기 10년의 형이 확정돼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에 수감될 때 6,000여명의 구경꾼이 몰리는 혼잡까지 빚었다. 3년4개월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그는 매사추세츠의 목장에서 여생을 보내다 1974년 86세로 사망했지만 아직도 ‘휘트니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기억된다. 악행은 영원히 남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