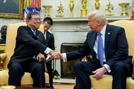<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2월 5일] 중국선 찾기 힘든 한국 건설사
입력2010-02-04 18:23:01
수정
2010.02.04 18:23:01
톈진 도심에서 50㎞ 떨어진 빈하이 신구(新區)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덩샤오핑의 선전(1980년대)과 장쩌민의 상하이 푸둥(1990년대)에 이어 현 중국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시대의 발전을 상징하는 환발해권 경제권의 핵심이다.
전체 면적이 2,270㎢에 달하는 이 경제특구 곳곳에서는 규모에 걸맞게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올라서고 대규모 항만ㆍ도로ㆍ주택 등 인프라 건설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건설업체는 오직 1곳뿐이다. 중동 플랜트 시장의 강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부르즈 칼리파)을 지은 한국 건설업체의 위상을 생각하면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딱히 톈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중국과 수교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지만 상하이ㆍ베이징 등 중국의 거점도시들을 살펴봐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건설업체는 이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수교 후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호기 있게 중국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이 불과 4~5년 만에 고개를 저으며 중국사업을 철수했다.
한 해외건설단체 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동남아나 중동과 달리 중국 시장은 외부인들에게 다소 배타적이고 까다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억 인구의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자고 나면 거리 모습이 바뀔 정도로 빠른 개발이 이뤄지는 중국 시장을 이대로 포기한다는 것은 해외사업에 목마른 한국 건설업체들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만 1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해온 한 국내 건설업체 주재원은 "1~2번의 실패를 겪고 현지 관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파트너와 분쟁도 해보며 10년은 죽기 살기로 버텨야 비로소 중국 시장이 보이고 신뢰가 쌓인다"고 말했다.
중동의 플랜트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영원한 금고가 될 수 없고 동남아 역시 중국업체들의 추격이 매섭다. 다행히 '한국형 주택'과 건축은 이미 중동ㆍ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 시장은 한국 건설업체들에 영원히 문이 닫힐지도 모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