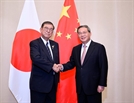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대 뉴스 메이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화학자 출신으로 온순한 성격에다 오페라ㆍ축구광으로 알려진 그의 말 한마디에 주요국의 주식ㆍ채권 시장,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춤을 추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이탈리아의 한 유력 경제지는 1면에 '빨리, 메르켈(Schnell, Frau Merkel)'이라는 독일어 제목이 달린 기사를 실었다.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자국 총리도 아닌 독일 총리에게 읍소를 한 것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돈을 풀어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긴축안 유지와 재정동맹이 우선이라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유로존에 남아 긴축을 참아가며 독일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로존을 이탈해 자유를 얻되 더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인지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공공연히 히틀러에 비유되는 등 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증오감도 커지고 있다.
유로존, 붕괴냐 더 큰 통합이냐
사실 이 같은 갈등과 반목은 10여전 유로존이 출범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돼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유로존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는 무시하고 재정통합 없이 통화만 단일화하는 바람에 남유럽 국가는 통화 가치가 고평가 되면서 산업 경쟁력 악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렸다. 반면 독일 등 북유럽 국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통합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하지만 이 같은 불균형 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 1990년대 구소련 국가들의 루블존(루블화 사용국)의 실패 사례처럼 재정ㆍ정치 동맹 없는 통화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제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 회원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유로존 차원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떠안는 방법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긴축과 구조 개혁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남유럽 국가들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독일 등의 성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제는 독일이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로존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유럽 지배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적당한 타협의 길을 모색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독일이 29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스페인ㆍ이탈리아 정상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 구제금융을 통한 역내 은행 지원에 합의해준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정도의 소규모 유로존 붕괴도 공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진영은 뱅크런, 국채 투매 등으로 유로존이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공동 대응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예금의 공동 보장 등 금융 동맹이 불가피하고 그래도 위기가 닥치면 재정 동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뭉칠수록 시스템 리스크 더 커져
하지만 '빚으로 빚을 막겠다'는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해법이나 '돈은 벌지 말고 살림살이만 줄여라'는 독일의 처방이 접점을 찾기까지는 기나긴 세월과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유로존 통합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위기의 빈발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역설적으로 한번 위기가 터지면 폭발력은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메가톤급이라는 점이다.
독일 등 우량국과 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위기국 간의 연결 고리가 더 촘촘해지면서 위기가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궁극적으로 유럽합중국이라는 정치 동맹을 탄생시킬 때까지 뭉치면 뭉칠수록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유로존 붕괴라는 파국이다. 우리 경제로서도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긴 호흡을 갖고 유로존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