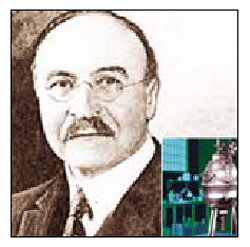|
‘폭발하는 당구공.’ 가능할 얘기일까. 그렇다. 가끔 터지는 인조 당구공에 사람이 다친 적이 있다. 인조 당구공이 등장한 시기는 1870년. 인쇄공 하이아트에 의해서다. 급증하는 당구 인구로 공의 재료인 코끼리 상아가 부족해지자 대체물질로 개발된 게 하이아트의 합성수지, 셀룰로이드다. 7년간 연구 끝에 나온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는 곧잘 폭발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결국 셀룰로이드는 당구공 재료 대신 장난감과 영화용 필름을 만드는 데 사용됐으나 폭발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는 터지는 당구공으로부터 3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열렸다. 벨기에 출신 미국인 발명가 베이클랜드(Leo Baekeland)는 터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합성수지를 개발해 1909년 12월7일 특허를 따냈다. 오늘날의 플라스틱과 비슷한 발명품에 ‘베이클라이트’라는 명칭을 붙인 베이클랜드는 곧 돈방석에 앉았다. 전기가 급속도로 보급되던 시기에 녹지도, 부식되지도 않고 가벼운데다 절연성이 뛰어난 베이클라이트는 전기제품 재료로 안성맞춤이었다. 대공황기를 맞아 주춤거렸던 사업은 2차 대전이 터진 뒤 다시금 활기를 찾았다. 베이클라이트도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성형하기 쉽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의 ‘플라스티코스’에서 이름을 따온 것처럼 플라스틱은 온갖 생산품으로 진화했다. 나일론 스타킹도 플라스틱의 파생물이다. 문제는 환경오염. 조물주가 창조하지 않은 물품을 만든 형벌일까.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유해 환경호르몬을 방출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 부식되는 친환경 제품이 나왔다지만 실용화하기에는 가격이 비싸다. 백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쓰고 버린 플리스틱 쓰레기에 수십억년을 내려온 지구촌이 멍들어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