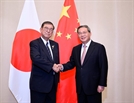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국내 초중고교 운동장 100곳 중 14곳 꼴로 인조잔디가 깔려 있다. 인조잔디 공설운동장도 흔한 세상이다. 비만 오면 진창이 되거나 물웅덩이가 생기고, 가물 때면 흙먼지 폴폴 나는 맨땅 운동장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인조잔디는 깔끔해 보이지만 설치비용이 한 곳당 5~7억원가량이 들고 유지관리ㆍ교체비용도 만만찮다. 유해성 논란도 여전하다.
△인조잔디(artificial turf)는 1956년 미국에서 처음 제작됐다. 1966년 텍사스주 애스트러돔 실내야구장에 시공된 이후 축구장, 필드하키장, 레저시설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리덴(PVDC)ㆍ폴리에틸렌(PE)ㆍ폴리프로필렌(PP)ㆍ나일론 등 합성섬유로 만들며 바닥에는 충격을 줄이고 넘어질 때 부상 예방을 위해 충진재를 깐다. 보기에 좋지만 인조는 천연만 못하다. 인조잔디가 깔린 홈구장을 쓰는 프로야구팀은 부상자로 넘친다. 선수가 발목ㆍ무릎 등에 받는 충격이 천연잔디 구장의 1.5~2배나 돼 인대ㆍ근육 부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인조잔디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7년 안팎. 하지만 6개월~1년 단위로 보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실시공도 적잖아 실제 수명은 이보다 짧다. 초중고교 인조잔디 운동장 10곳 중 4곳은 사용한지 5년이 넘어 많이 닳았거나 군데군데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제때 보수ㆍ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유해성 논란도 만만찮다. 환경부 조사에서 벤젠 같은 발암물질은 물론 납ㆍ크롬ㆍ아연 등 중금속도 상당량 검출됐다. 초기에 충진재로 사용한 폐타이어 조각들이 마모되면서 신발ㆍ옷ㆍ인체 등에 시커멓게 묻거나 호흡기ㆍ피부 등을 통해 인체로 흡수된다. 성능이 개선된 신소재 인조잔디구장의 잔디 부분도 몇 년 사용하면 잘게 부숴져 옷ㆍ신발 등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설치에 반대하기도 한다. 맨땅 운동장으로 돌아가야 유해성ㆍ비용 논란에서 벗어날까. /임웅재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