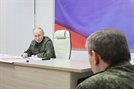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
|
뮤지컬 다작(多作) 경쟁 속에 작품성은 물론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제작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소품이나 세트들도 점차 정교해지며 배경이 아닌 무대 위의 '또 다른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달 5일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에는 대형 트레드밀 3대가 등장한다. 트레드밀은 극 중 배경인 신발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주된 무대로도 활용된다. 각각 200 센티미터, 무게 350 킬로그램의 트레드밀 3대가 합체와 분리를 반복하는 동안 배우들은 그 위에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 이 기구의 대당 한화 가치만 8,5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9월 막을 내린 '프리실라'에는 길이 10 미터, 무게 8.5 톤 짜리 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버스 크기의 이 세트는 드랙퀸(여장남자) 주인공들의 여성성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와 LED 조명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외벽으로 '세상에서 가장 육중한 디바'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이 밖에도 '조로' 가 대형 열차 세트를 무대 위에 올려 배우들의 실감 나는 결투 장면을 연출했고, '고스트'는 700개의 LED 판을 무대 전면에 설치, 팝아트적인 독특한 영상 배경을 선보였다.
이처럼 최근 개막하는 주요 뮤지컬은 관객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길 소품이나 무대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관객들이 특정 배우와 음악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무대 위의 특정 장면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을 돋보이게 하면서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만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해져 소품이나 무대장치는 점점 더 화려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뮤지컬에 등장하는 무대 소품이나 기술 대부분을 거액을 주고 외국에서 빌려온다는 점이다. 대형 라이선스 작품은 계약 시 주요 장비를 함께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 같은 계약이 없더라도 국내 뮤지컬 시장은 무대 기술 개발이나 투자가 아직은 빈약하다. 평균 2~3개월짜리 작품을 위해 거액을 들여 장비를 개발·제작하느니 렌탈 비용과 깐깐한 세관을 감내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치가 고장 나면 국내에서 대체 부품을 급하게 구해다 조마조마하게 사용하는 일도 많다. '캣츠' 오리지널 내한과 국내 공연을 기획한 설앤컴퍼니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대에서 썼던 '리프트 타이어'라는 대형 장비를 아예 사들였다. 회사 관계자는 "공연 때마다 들여오는 절차도 복잡한 데다 국내에서 캣츠 외 다른 작품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뮤지컬 평론가인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는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앤드의 경우 뮤지컬 한 편이 수년 넘게 장기 공연하는 사례가 흔하다 보니 특정 장비를 개발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제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공연 기간이 대부분 2~3개월인데다 재공연을 한다 해도 보관·보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