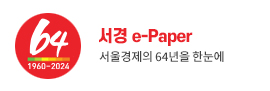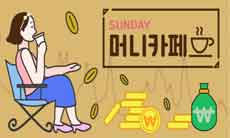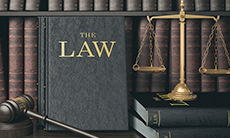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
누군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뉴스 100% 사실일까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나, 알려져서는 안 될 속사정이 감춰져 있지는 않을까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대가 튼튼해진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음모론, 배후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한 정황증거와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은 많은 이의 공감을 삽니다. 이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고 믿게 되면 더이상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되죠. 하버드대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은 음모론을 “전염병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경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며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거야. 누군가 이 일에 깊이 관련된 게 분명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와 기업 등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주체가 이 일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거대 조직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싶었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도록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 자료를 해석하고 끼워 맞추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작용하는 것이죠. 또 확산에 대한 쾌감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에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일종의 뿌듯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모론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능동적 감시자 역할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가 밝혀지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과 루머는 한 끝 차이라고 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유하고 퍼뜨리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증권가 찌라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본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카더라’는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처음 믿었던 내용을 쉽게 번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보가 나면 ‘바로잡습니다’라는 머리말을 붙여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뉴스로 인한 낙인효과 때문에 정정보도의 내용은 수용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사람들의 그릇된 믿음을 바로잡으려 해도 그 믿음을 더 굳혀주기만 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굳이 부정하려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부정은 음모론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뜻일 겁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고난을 많이 이겨낼수록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세가 타인에게 벗기 힘든 굴레를 씌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를 유발한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곳곳에서 현실이 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순간일 테니 말입니다.
/ iluvny23@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