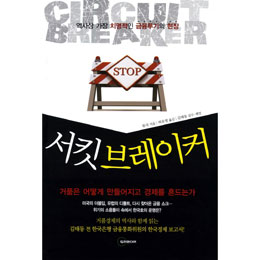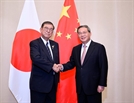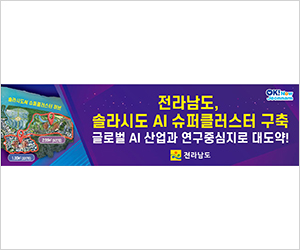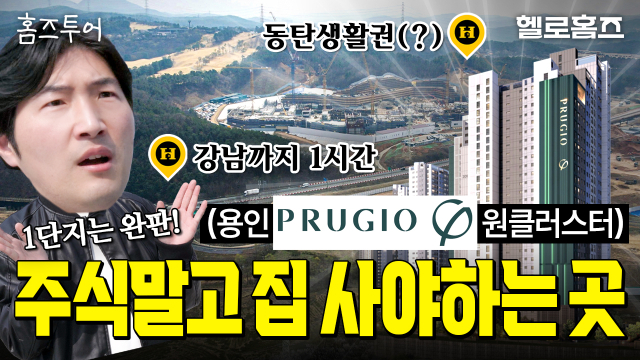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
자연 속 거품은 영롱한 빛깔과 함께 상상력까지 자극하지만 경제계의 거품은 그리 달갑지 않은 단어다. 1990년대 일본을 헤어날 수 없는 불황에 빠뜨린 ‘거품경제’ 붕괴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붕괴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지적했다. 코스피 2,000 돌파 때도 ‘거품’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고 곤두박질 친 주가는 우리 경제의 허약체질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출신 경제학자인 저자는 책을 통해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경제를 흔드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경제사에 등장했던 치명적인 거품 붕괴 사례 15건을 분석했다. 1636년 네덜란드에 불어닥친 튤립 재배 열풍은 가장 아름다운 거품으로 불린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튤립에 대한 광기어린 투기 열풍이 불었고 튤립 알뿌리 1.5파운드의 가격은 당시 네덜란드인 연평균 소득 150길더의 10배가 넘는 1,668길더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튤립 알뿌리를 사겠다는 사람이 뚝 끊겼고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됐다. 1869년 미국에서는 금값 거품이 일었다. 그 해 9월24일 금요일 뉴욕의 금 시장이 열리자 온스당 금값은 145달러에서 162달러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사업의 귀재 제이 굴드가 개입된 철저한 가격 조작 사건이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그랜트 대통령의 정부는 다음날인 토요일에 400만 달러어치의 금을 시중에 풀 계획이라고 정오께 발표했다. 정오를 알리는 교회당의 종소리가 12번 울리는 그 짧은 시간에 금값은 폭락했다. 지금도 증시에서 널리 사용되는 ‘검은 금요일’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1차 세계대전 뒤 독일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당시 기업은 직원들에게 돈다발을 월급으로 던져줬었고, 돈을 수레에 가득 싣고 시장에 간 한 가정주부는 돈은 버려둔 채 수레만 도둑맞은 일화도 있다. 화폐의 가치 역시 거품일 수 있다는 사례다. 책의 마지막 장은 ‘거품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제언이 담겼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쓴 글로, 앞선 우리 경제의 거품들을 한 눈에 보여준다. 김 교수는 특히 뉴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부동산과 재벌 거품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 류샤 교수는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휩쓸렸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한발 물러나 자신을 지키고 심지어 큰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철한 지혜와 결단력, 역사 속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만4,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