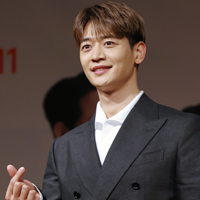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
만약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 살면서 경험한 기쁨과 슬픔·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뇌 속에 저장하고 있다면…. 아마도 인간은 과거의 노예가 돼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버릴 것이다. 망각은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자유를 제공하는 신이 내린 축복이다. 미국 소설가 숄렘 애쉬가 "우리 실존의 필수 조건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 인간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송수신 기술의 등장은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기억하게 만들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휴대폰만 해도 내 위치정보와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신사로 보내고 거리 곳곳에 달린 CCTV는 18분에 한 번씩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안업체와 구청에 소상히 알려주고 저장한다. 신용·체크카드까지 쇼핑목록을 친절하게 카드사와 은행에 넣어주니 이제 개인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
자신이 원한 게 아니다. 단지 상대방이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진 주민등록번호는 생일과 출신지·성별 등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410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기업에 가져가도 좋다고 명시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기업이 아닌 본인이다. 정보의 생산·수정·삭제의 권한도 제공자 자신의 책임하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활용수단에 가까웠다. 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인에게 사라진 이유이며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를 담은 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 8년이나 빠른 1987년에 시행된 까닭이기도 하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다른 이의 정보가 자기 것이 됐는데 기업이 그냥 놔둘 리 있나. 어떻게든 돈벌이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카드 하나 발급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집주소·휴대폰번호·직장, 심지어 결혼과 자동차 보유 유무까지 확보할 수 있다. 내 생활을 훤히 들여다보니 이보다 좋은 마케팅 수단이 또 없다. 계열사끼리 돌려볼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보 주권을 빼앗긴 개인은 3개 카드사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배가 넘는 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그 이전 5년간 또 다른 1억건이 털렸어도 없애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내 모든 것을 남이 쥐고 흔드는 사회의 무기력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조용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디지털 사회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정보의 주체에게 수정·삭제·파기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등장이자 디지털 사회에서 잃어버린 망각의 부활이었다.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대학생들 5명 중 4명이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자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에서도 변화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망각이 지워지면서 발생한 병리 현상이다. 치료제는 망각을 되찾는 것, 개인에게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해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홍길동처럼 내 정보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는 비정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