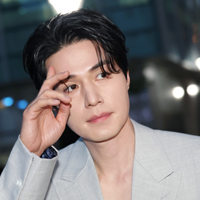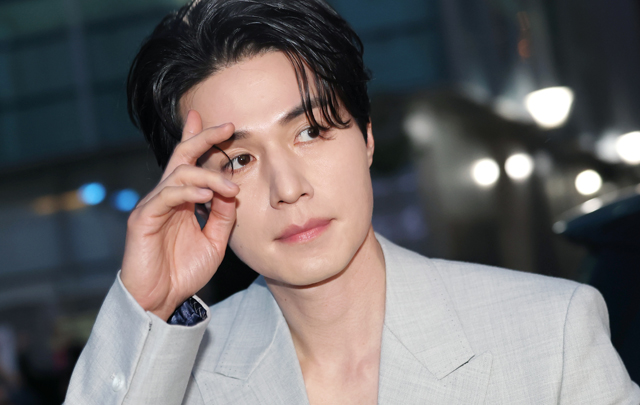경제적 국수주의가 지지를 받는 데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세계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익숙한 자국시장은 조정하기가 쉬워 당장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급한 판단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더 큰 이유는 국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외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들의 국수주의적 선택이다. 문제는 갖가지 경제 국수주의적 선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비교우위 효과를 없애 글로벌 경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보호무역조치가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낳고 무역상대국끼리 공방이 치열해지다 보면 함께 공멸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수록 초기의 작은 효과는 온 데 간 데 없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1930년대의 대공항은 이 점을 잘 증명하고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2만여개의 수입상품에 관세를 평균 20%나 올리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킨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연이은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관세를 취하자 1930년 1월 49억달러였던 세계무역액이 2년 뒤에는 21억달러로 줄어들었고 미국의 실업률도 덩달아 늘어 1930년 9%에서 1931년 16%, 1932년에는 25%까지 급증했다. 한편 올해 세계교역량은 3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제소는 전반적으로 4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섬게임으로 여겨지는 환율 분야는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제무역은 윈윈할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오르면 상대국 환율이 떨어지지만 무역흑자를 내기 위해 우리가 수입을 줄이면 상대국 수출도 줄어 소득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이 불가피하게 환율안정을 무시하고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만해도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남길 텐데 자금지원에 보호무역의 족쇄까지 채우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과 보호무역의 연결고리를 끊고 공통된 원칙 아래 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해나가는 것만이 공생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나서야
지난 14일 로마에서 폐막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은 국제공조에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20개국(G20)의 공동의장국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막을 의제설정과 조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0년 전 외환위기가 지나친 해외차입 때문에 발생했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높은 해외수요 의존도가 허물어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