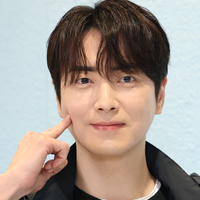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매년 6조~24조원에 이른다. 지난 40여년간 조세회피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누적액만도 7,790억달러로 세계 3위라는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분석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자금이동이겠지만 역외탈세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여원을 추징한 게 그 증거다. 하지만 적발된 역외탈세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역외탈세가 대부분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지는데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서다.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고 이를 확보해도 상대방 정부에 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다자간 협정 서명으로 2017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금융투자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국세청에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9월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통보대상도 사실상 모든 계좌(법인의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초과)의 이자·배당·기타원천소득과 계좌잔액 등 매우 광범위하다.
역외탈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편익의 갈취나 다름없다.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 쓸 데는 많은데 저성장과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다자간·양자간 조세협정 확대·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을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현재는 10억원 이상인데 다자간 협정의 자동 통보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계좌인 만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