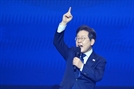이번 당사국 총회는 어떤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추가 포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우리나라는 2008~2012년 진행되는 교토체제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위임을 감안할 때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Post) 교토체제'에서는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국내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다(多)배출국이면서도 감축의무에서 제외됐던 미국ㆍ중국ㆍ인도 등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감축의무국에 포함돼야 한다며 다양한 제제수단을 제시,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교토협약의 가장 큰 약점으로 "협약 불참국이나 감축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참여국에 대한 제재ㆍ불이익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참여국의 실질적 손실가 발생되는 관세ㆍ비관세 무역조치와 같은 '녹색 보호주의' 강화다. 유럽연합(EU)ㆍ미국 등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국경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장벽 외에도 미국은 연비가 22.5mpg 미만인 신규 모델 승용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에 추징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너스-마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원료 확보ㆍ생산ㆍ유통ㆍ폐기에 이르는 모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이 같은 이산화탄소 규제와 글로벌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6.0%에 불과했다. 1995~2005년 EU 27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3.2% 감소한 반면 한국은 103.3%나 늘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ㆍ녹색기술 확보를
때문에 한국 기업은 하루빨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국내 기업 중 이 분야에 가장 적극적인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력ㆍ태양광ㆍ풍력ㆍ부산물 이용 분야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검증을 거쳐 연간 4만3,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LCD 기업인 일본의 샤프는 태양광에, 영국 BP는 정유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살려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이미 진출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녹색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가메사(Gamesa)와 에콘텍니아(Econtecnia)가 풍력기술 선두 유지를 위해 'Windlider 2015'라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기업들은 이 밖에도 지속가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탄소배출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을 충실히 준비해 기업가치 하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