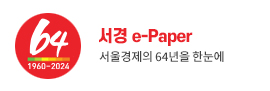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크게 늘면 늘수록 제품생산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와 기계류 수입이 급증해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여왔다. 지난해 이 같은 구조가 깨졌다. 수출이 5,000억 달러가 넘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대일 적자는 이례적으로 84억 달러(12월20일까지)나 감소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연 이것이 대세적 변화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일본 대지진의 결과이다. 지진으로 일본 정유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한국에 대한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했다. 슈퍼 엔고도 작용했다. 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해외부품 및 완제품 수입을 크게 늘렸다. 엔고ㆍ원저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제품은 매력적인 수입 대상이 됐다. 조명기기, 건설광산기계, 합성고무, 음향기기, 사무기기 등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사실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대일무역적자 감소는 사상 최초의 수출확대형 효과라는 점을 또한 특기할만하다.
과거 두 차례(1998년, 2008년) 대일적자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동시에 수입도 줄어 대일적자가 줄어든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은 지난해 결과를 강력한 디딤돌로 삼아 비전과 자신감을 갖고 대일무역역조의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책방향은 수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늘리는 쪽이 돼야 한다. 지금 일본기업들은 초엔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품의 해외조달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절호의 기회이다.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기업들은 이미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한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부품소재 분야 역시 EU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강화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