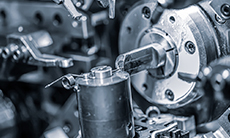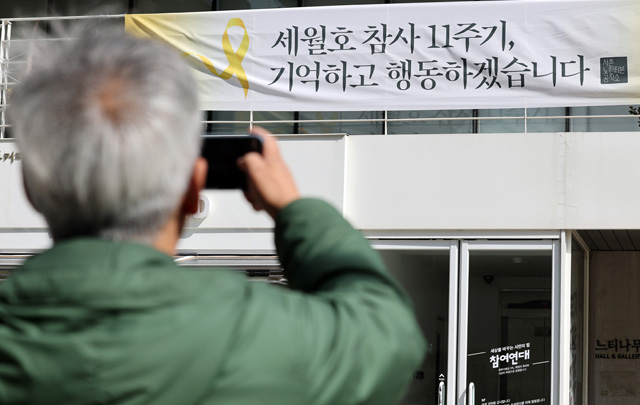올해 무역규모가 쪼그라든 데는 수출감소의 영향이 컸다. 유가 하락으로 1월 석유 관련 수출이 부진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중국 등 세계 교역 둔화, 엔화·유로화 약세, 그리스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스 사태의 불씨는 여전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낮아 남은 하반기 수출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수출부진의 심각성을 알고 4월에 이어 7월에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내용을 재탕 삼탕으로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수출부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넋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결국 수출에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대책은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당장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경제발전 방향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꿔나가는 데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이제껏 중간재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단순 가공무역을 했고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해왔지만 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력 향상만이 지속적 수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