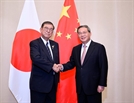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1847년 10월17일, 런던. 주초인 이날 단기국채 금리가 4%에서 6%대로 뛰었다. 주말에 이르러서는 11%대까지 치솟았다. 일주일에 금리가 세 배 가까이 폭등한 이 시기는 ‘공포의 일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사에 희미하게 남아 있다. 사태의 원인은 두 가지. 철도와 밀 투기 탓이다. 무엇보다 철도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컸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노선이 1,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투자계획 자체가 터무니없었다. 실행하려면 당시 영국의 국민총생산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음에도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투기에 뛰어들었다. 초기의 철도 투자가 고배당은 물론 부지확보라는 덤까지 안겨줬다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서다. 과열의 후유증이 나타난 것은 1846년부터. 중복투자로 배당률이 하락하며 철도회사가 도산하고 채무자감옥은 대출을 얻어 투자했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여기에 밀 작황에 대한 투기가 맞물려 시장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안전자산인 금(金) 선호도가 높아졌다. 잉글랜드은행이 금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업무를 일부 중단하자 ‘공포의 일주일’이 찾아왔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금과 외환보유액마저 줄어들었다. 공포를 잠재운 것은 ‘돈의 홍수’. 1844년 은행법에서 금지한 재할인을 허용, 잉글랜드은행이 금보유액과 관계없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부 조치가 나오자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다. ‘1847년의 짧은 공황’을 야기한 과잉 중복투자에는 정부 개입을 죄악시했던 초기의 경제이론, 즉 ‘자유방임주의’가 깔려 있다. ‘공포의 일주일’로부터 161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위기에 빠져 있다. 전세계적인 돈의 홍수라는 약발도 안 먹힌다. ‘공포의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두렵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