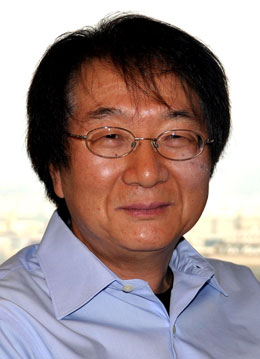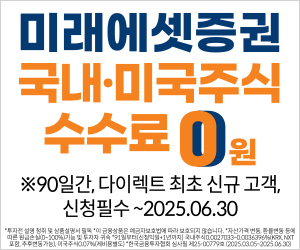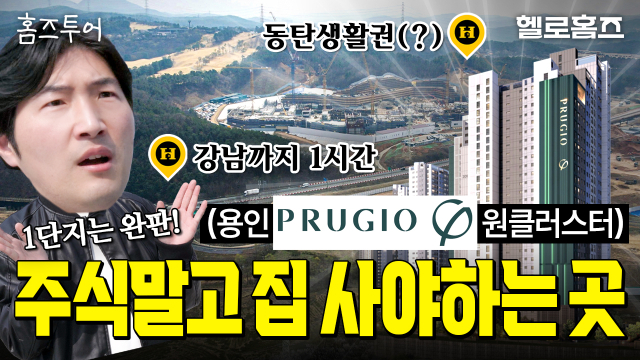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연간 특허 등록건수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돈이 되는 우수한 특허를 서둘러 확보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ㆍIP)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고 뒤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28년간 IBM 본사에서 일하면서 '수석발명가(master inventor)'로 불렸던 김문주(64ㆍ사진) 아주대 지식재산공학과 초빙교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품질이 기업혁신을 평가하는 잣대"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9년 IBM 퇴직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벤처투자사인 하버퍼시픽캐피털(HPC) 기술자문역을 맡아왔고 한때 삼성전자 사장단 기술고문도 지냈다.
그는 "IBM이 페이스북에 특허 500건을 10억달러에 판매하는 등 매년 IP로 최대 35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수십년간 알토란 같은 IP를 쌓아놓은 덕분"이라며 "특허 출원과정부터 기술의 혁신정도ㆍ사업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1982년 IBM에 입사해 컴퓨터 엔지니어로는 최고 자리인 CSA(Chief System Architect)에 올랐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쏟아내 미국 특허 68건을 포함해 150여건의 국제특허를 등록, IBM가 연간 수억달러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z' 시리즈와 병렬형(MPP) 슈퍼컴, 그리드 컴퓨터인 GT3,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시스템인 HFC 등의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최근에도 저전력 모바일 전자부품, 모바일용 반도체칩 디자인 등 관심 분야에 매년 1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아주대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설립 당시 자문한 것이 인연이 돼 3년째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는 "미국의 공대에서는 3~4학년 때 대부분 창업을 한다"며 "물론 창업에 앞서 자신의 IP를 먼저 확보하는 게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주대 지식재산공학과에서 특허등록 과정과 특허의 비즈니스 전환 등 IP와 관련된 나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며 "이곳 학생들도 이제 IP를 근거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실리콘밸리에서는 벤처를 발굴할 때 인간성, 비전과 계획, IP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뒤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실패 책임도 투자자가 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창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그들의 IP 수준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IP가 탄탄한 기업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을 통한 IP 축적을 게을리한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미줄처럼 복잡한 미국의 벤처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우리 중소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 쌓은 지식을 그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97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컴퓨터공학 명문대인 시러큐스대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IBM 사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딴 그는 "컴퓨터 회로 설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섭렵해야 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과학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라며 "빌 게이츠도 시스템 아키텍트였다"면서 으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