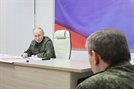지난해 겨울 민간기상업체들은 모두 기상청에 '집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당시는 한 민간기상업체에서 고객사에 제공한 날씨예보의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과 기상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기상청은 명목상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사실상 출처 표기를 잘 하라는 당부가 전부였다. 민간기상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해결하면 될 일을 두고 다른 업체들까지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7년 민간예보사업이 가능해진 후 2009년 12월에는 기상산업진흥법까지 마련됐지만 민간기상업체들은 여전히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민간기상업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에서 하고 있던 예보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기상산업진흥'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상청이 하루 한 번이던 주간예보를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늘리기로 했을 때도 민간기상업체들이 단체로 반발하는 바람에 변경 시기가 늦춰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2008년 10월 동네예보체계가 바뀔 때에는 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10월 말에야 받을 수 있었다.
기상청에 영리기관까지 무료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면서 한 업체는 지난 10년간 6곳의 고객사를 잃었다.
취재하면서 만난 업체들은 모두 기상청이 대외적으로는 기상산업 진흥을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관 주도의 구조를 벗어날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관공서와 민간의 '갑을관계'가 비단 기상청만의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상산업은 아직 규모도 크지 않고 연구자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업체들이 할 말은 하는 분위기"라며 "관과 함께 일해야 하는 다른 분야의 '을(민간업체)'들은 어떨지 안 봐도 선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