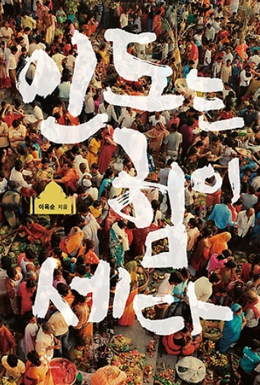|
인도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시시각각 바뀌는 '뉴스'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5,000년 인도의 역사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인도문명의 핵심에 시선을 둬야 한다. 이것이 인도전문가인 이옥순 연세대 교수가 '인도는 힘이 세다'를 쓴 이유다.
인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개 인도를 기회와 황금의 땅으로 여긴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인은 열강에 약탈당했던 과거를 되풀이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이 인도를 상대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유다.
올해는 한국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는 해다. 마힌드라 그룹이 국내의 쌍용차를 인수하고, 포스코가 인도 현지에 제철소를 세우려는 등 인도는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인도 증시의 선섹스지수도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인도와 가까워질 수록 그들의 국민성에 대해 불신을 갖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게으르고 신용이 없고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인도인들 각각은 꼴보기 싫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넓다. 유럽대륙과 맞먹는 영토, 12억이 넘는 인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쇠고기를 먹는 힌두교도도 존재한다. 또 인도를 정신주의의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인의 물신주의와 장사 수완에 놀라기도 한다.
인도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카스트제도의 문제다. 즉 신분이 정해져 있는 카스트제도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성과를 보장받을 수 없어 성취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고대부터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상인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아라비아숫자'를 아라비아인이 아닌 인도 상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인도에서 사업이나 장사는 '장사나 할까?'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카스트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천직이었다. 오늘날 타타ㆍ비를라ㆍ고엔카ㆍ달미아ㆍ고드레지 같은 대기업 집단은 신드 상인, 구자라트 상인, 파르시 상인 등 고대부터 바다를 통해 부를 축적한 서해안지방의 상인들이 세웠다. 1991년 인도가 경제자유화로 방향을 선회한 뒤 나타난 신흥 억만장자도 모두 상인출신이다.
중국과의 비교도 흥미롭다. 저자는 인도의 손을 들어준다. 세계의 중심을 자처한 중국은 역사 이래 언제나 주변국을 한 수 내려다보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국굴기'를 외치는 나라다. 반면 인도문명은 현세적인 것만큼 내세에 의미를 두고 '위대한 나라'보다는 '진정한 나'를 찾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다원적인 인도는 내부비판이 많아서 속도가 다소 늦기도 하다. 하지만 힘을 가지기보다 힘을 버리는 것을 칭송하는 인도문명의 정수는 살아있고 이것이 21세기에 더 어울린다고 저자는 해석한다.
저자는 인도의 델리대학에서 인도사를 전공한 인도 전문가다. 책은 5,000년간 변한 듯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인도의 모습을 9개의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인도의 현재와 가능성을 통찰하는 저자의 설명과 25년간 인도와 한국을 넘나든 경험이 어우러져 읽는 맛도 뛰어나다. 1만6,5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