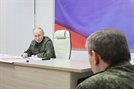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
수입차 '피아트 500' 차주들로 구성된 한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2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2,990만원에 출시된 피아트 500(라운지 모델)이 이날부터 1,830만원이란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려 3분의 1이 할인돼 이미 차를 산 차주들은 앉아서 최대 1,000만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신차 값이 떨어지면 중고차 값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이 동호회의 회원인 김석재 씨는 "수입차에 가격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고 가격 정상화는 자체는 찬성이지만, 차주들의 자부심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심한 것 아니냐"며 "피아트 본사 등으로 직접 항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의 가격 할인폭이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크라이슬러는 대형 세단인 '300C'의 가격을 1,120만원 인하했다. 한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미리 반영되긴 했지만, FTA 효과를 선반영한 유럽·미국산 차에 비해 인하폭이 컸다. 인피니티는 지난해 6월 'G25'의 가격을 570만원 내린 3,770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500만원 이하의 할인은 수입차 시장에서 '상시 할인'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렉서스는 지난 3월 출시한 신형 'CT200h'의 가격을 기존 모델보다 210만~410만원 내렸다. BMW나 아우디는 공식 프로모션이 거의 없지만 역시 정가 그대로 사는 소비자가 드물다. 수백 만원 대의 '딜러 할인'은 기본이다. 수입차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딜러가 대뜸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고 물을 정도다.
수입차 업계에서 할인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재고'다. 해외로부터 수입한 차량이 뜻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해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할당'이다. 수입차 브랜드 본사는 한국에 수출할 물량을 연 단위로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차종이라도 한국의 규제와 소비자 취향에 맞게 사양을 조정해야만 한국 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본사의 계획은 곧 할당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 법인은 할당 분량을 판매로 연결하기 위해 할인을 감행하는 수가 많다.
이 같은 구조에서 한 업체가 특정 차종에 대해 할인을 하기 시작하면 경쟁차 대부분이 할인으로 대응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수입차 브랜드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인하되면 먼저 샀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며 "나머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게 돼서 반가울 수 있겠지만 자동차 판매 마진이 줄어든 업체는 애프터서비스 분야에서 마진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특정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가 늘면서 애프터서비스 자체가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입차 판매가 급증세를 타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관련 불만 건수는 2008년 56건에서 2012년 187건으로 5년 새 3배가 늘었다.
한 국산차 업체 관계자는 "국산차 브랜드의 경우 어느 대리점을 가든 할인폭은 수십만원 대로 비슷하지만, 수입차는 딜러와 구입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백만원대"라며 "정상적인 가격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