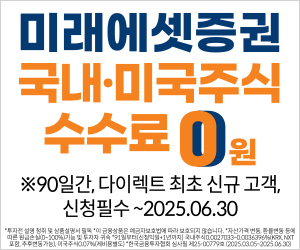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
19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가을이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나무 밑으로 달려갔다. 바위틈이나 풀밭에서 황금색 큰 알밤을 찾으면 횡재라도 한 것처럼 좋아했다. 집집마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빨갛게 익은 고추들을 널어 말렸다. 그 위에 수많은 고추잠자리가 무리 지어 맴도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학교 가는 길 옆에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피었다. 발소리가 날까 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살금살금 다가가 잠자리를 잡던 일도 즐거웠던 추억 중 하나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을 찾았다. 마루에 보따리를 펼치면 이웃사람들까지 모여들어 가족들에게 줄 양말이나 내의를 샀다. 추석선물 겸 겨울준비다. 물건값은 쌀이나 좁쌀 몇 되(1되=0.18리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농촌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팔 옷과 옷값으로 받은 곡식을 머리에 이고 다녀야 했던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노고가 여간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추석 전날이나 전전날에 기정(술빵의 일종)과 송편을 만드셨다. 하얀 기정에는 뒤뜰에 핀 빨간 맨드라미 꽃잎과 아버지가 따온 검은 석이버섯으로 예쁘게 수를 놓았다. 기정과 송편이 다 익으면 어머니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서 젓가락에 그것을 끼워주셨다. 방금 쪄낸 뜨거운 기정이나 송편을 입으로 호호 불며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어린 시절 추석은 나에게 더없이 즐거운 명절이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1961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총액은 21억달러에 불과했다. 2013년 한국의 국민소득이 1조3,000억달러를 넘었다. 숫자로만 보면 50년 만에 600배나 성장한 것이다. 산업혁명 전 1,000년 동안 인류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0.2%라고 한다.
소득이 600배 성장하려면 3,000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지난 50년간 열심히 달렸고 많이도 변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60년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가을이다. 그리고 다시 추석이다. 경제 발전으로 보따리장수 아주머니들은 없어졌고 대신 백화점과 택배회사가 성업 중이다. 풍부해졌지만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박하고 정감 어린 선물은 상업적·사회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는 화려한 포장과 고가의 선물로 바뀌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코스모스와 고추잠자리의 계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