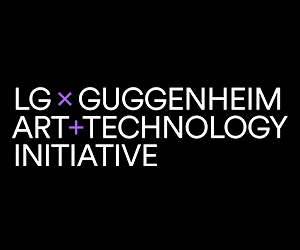월세급등은 직장 초년생이나 대학생ㆍ서민에게 직격탄이다. 이들이 주택시장의 최하부에 있는 월세의 주수요층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진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은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고 있다. 오죽하면 월세난민이니 하는 말까지 등장했을까 싶다.
월세난이 심각해지는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서민층이 주택구매를 포기하고 임차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중산층에서 전세를 많이 찾다 보니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게 돼 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의 월세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한 것은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는 서민의 생활상을 웅변한다.
치솟는 월세 등 임차시장을 안정시킬 마땅한 수단을 정부가 못 찾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난이 커졌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제어장치가 미약해 서민의 고통이 더 크다. 공급확대를 위한 임대사업자 육성이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상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세제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등의 소극적 정책으로는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 처방은 공급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주택수요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공 부문이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도심에 소형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실정에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자칫 공급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리 대출 시스템을 다각도로 강구해 서민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모기지 상품 개발에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