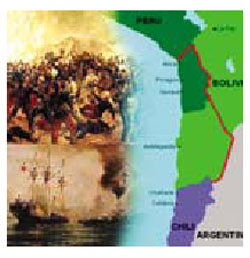|
1883년 10월29일 페루의 지방도시 앙콘. 1879년부터 계속된 ‘태평양전쟁’을 종결하는 앙콘조약이 맺어졌다. 골자는 페루 영토의 칠레 할양. 이듬해 후속조약에서 볼리비아도 칠레에 해안 지역을 내주고 내륙국가로 전락했다. 전쟁의 원인은 새똥. 페루 연안 섬에 수백미터 높이로 쌓인 새들의 배설물 퇴적층, 구아노(Guano) 때문이다. 천연비료로서 가치가 규명된 1840년대 이후 페루는 돈벼락과 날벼락을 차례로 맞았다. 구아노 수출로 연평균 9%씩 경제가 성장하는 호황가도를 달렸지만 영국 등의 훈수대로 대자본을 투자한 설탕 플랜테이션의 실패로 채무불이행까지 선언하는 공황에 빠진 것. 마침 칠레 국경지대에서 보다 큰 구아노 집적지와 화약의 원료인 칠레초석 광산까지 발견되자 페루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경제재건에 나섰다.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국유화에 반대한 유럽과 미국이 칠레를 꼬드겨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칠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볼리비아와 페루의 연합군은 칠레군에 번번이 깨졌다. 영국에 해군, 프랑스로부터 육군을 훈련받고 미국제 군수물자로 무장한 칠레는 순식간에 남미의 패자로 떠올랐다. 미국계 중국인이 대거 칠레로 이민한 것도 이때다. 영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자원지대를 얻은 칠레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위기로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자마자 영국ㆍ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란군이 일어나 정권이 뒤집혔다. 유럽과 미국이 사주한 자원확보 전쟁의 끝은 남미 3개국 모두의 파탄이었다. 전쟁 당사국들의 국민감정 대립은 여전하다. 볼리비아는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이면서도 빈국의 하나다. 123년 전 남미를 피로 물들인 제국주의는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옷만 갈아 있었을 뿐 아직도 살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