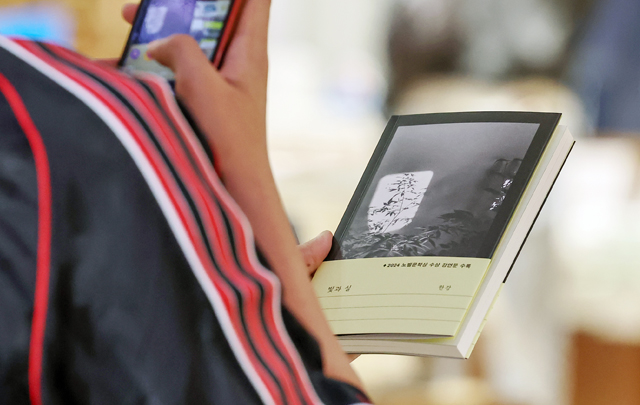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ㆍ자기공명영상(MRI)ㆍ양전자단층촬영(PET) 수가를 14.7~29.7% 인하했다. 그러자 병원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0월 영상장비 수가 직권인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결정이 불과 5개월 만에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해 CTㆍMRIㆍPET 수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병원들은 검사건수 추계방식, 장비 가동률 등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근거자료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한 채 직권조정이 이뤄진 것이 분쟁의 화근이었다.
정부, 일괄인하 근거자료 제시 못해
올해에는 일괄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더 큰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복제약값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값의 53.5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 제도 개편으로 1조7,000억원 이상의 약제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매출ㆍ수익성 저하로 1만3,000명이 직장을 잃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의 공통점은 정부가 급상승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이 설득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5년간의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2%)의 2.3배나 됐다. 따라서 이로 인해 늘어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일괄 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의 10~30%에 이른다는 것과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제약업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소세포성(非小細胞性ㆍNon-Small Cell) 폐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성분 기준으로 21종, 제품 기준으로 600종이 넘는다. 600여종의 약 가운데는 한 달 약값이 5만원 미만인 것이 있는가 하면 500만원 이상인 것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모든 폐암 치료 항암제가 동일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약효가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비싼데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도 있다.
급증하고 있는 항암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 먼저 항암제별로 효능ㆍ안전성ㆍ경제성 등 약의 실질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은 퇴출시키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노력 없이 일괄 약가 인하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약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면 페니실린처럼 필수약인데도 저가여서 생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약효ㆍ경제성 비교평가해 값 매겨야
영상검사료 인하 논쟁도 조만간 분쟁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고가 영상검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영상검사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검사료 인하 등에 대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등으로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최근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기반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의약품ㆍ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근거 중심의 접근이 보건의료 분야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