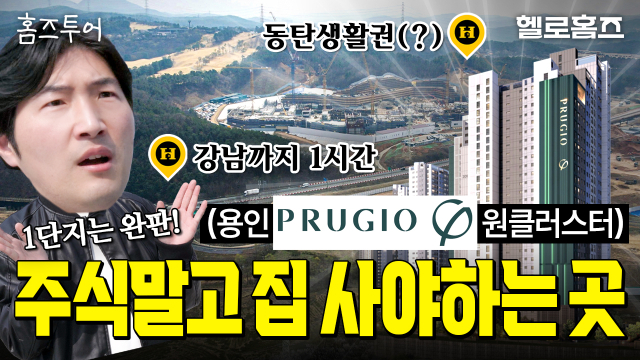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
|
|
지난 1월 말 찾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아라산커우 국제화물터미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며 영하 25도까지 내려간 기온에도 수십 대의 크레인이 쉴 틈 없이 화물 컨테이너를 옮겼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철도 궤도가 다르다 보니 동부연안 롄윈강·이우 등에서 출발해 7일간 달려온 화물열차는 아라산커우에서 잠시(1~2일) 숨을 고른다.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전6시59분 충칭 화물터미널을 출발하는 위신허우 열차도 아라산커우를 거쳐 중국을 빠져나간 뒤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를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까지 총 392시간을 달려간다.
아라산커우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중국의 제2의 개방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의 중국 서북쪽 거점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념인 '중국의 꿈'을 현실화하려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육로로는 내륙 중심인 시안을 거점으로 신장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독일 등 유럽까지 이어진다. 취안저우에서 출발하는 바닷길은 말레이시아·인도를 거쳐 케냐,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 유럽으로 뻗어나간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꿈꾸는 신실크로드 구상의 첫걸음이다. 60여개국을 아우르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위상을 높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총인구 44억명, 경제규모 21조달러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청사진이다.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중국의 미래 구상에는 한국·일본·러시아도 일대일로의 틀 안에 포함돼 있다. 투자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일대일로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중국 내 인프라 투자규모만도 1조400억위안(한화 약 183조원). 여기에 500억달러로 출발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기금(400억위안)까지 합치면 세계 최대 인프라 투자로 부상한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의 중심으로 선언한 신장위구르는 이미 일대일로의 기반시설 확충에 분주하다. 9인승 승합차에 15명이 몸을 싣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변경 무역도시 훠얼궈쓰. 우루무치에서 떼온 물건을 카자흐스탄 사르칸드를 거쳐 알마티로 실어나르는 화물차가 줄을 지어 통관검사를 기다린다. 통관절차는 의외로 간단해 30분 안팎이면 검사를 마친 화물차와 버스가 바로 출발한다. 아라산커우가 일대일로의 물류라면 훠얼궈쓰는 일대일로의 도매시장 격이다. 중국 정부는 240억위안을 훠얼궈쓰에 투자해 '중국·카자흐스탄 변경 합작중심'이라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 한해 이곳을 통과하는 물동량만 100만톤이 넘는다고 한다.
시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 시안은 옛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나라의 시장인 서시와 동시가 복원된 시안은 일대일로의 심장으로 부상했다. 시안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50여㎞ 떨어진 '시안 내륙항'. 대형 화물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한 켠에 장안포드 등 신차들이 열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국제화물열차인 장안호에 실린 자동차들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44개 도시로 수출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내륙항 주변의 44.6㎢에 이르는 국제보세구역과 각종 산업단지. 시안은 내륙 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의 복합체로 일대일로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안호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제품을 싣고 출발해 돌아올 때는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싣고 온다.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을 확보한다는 일대일로의 목표가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일대일로 전략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일단 중국의 일대일로 1단계 프로젝트에는 동북아가 빠져 있다. 하지만 동북3성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개발을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벨트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과잉설비와 투자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북 지역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철강·시멘트 등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동북 지역에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거대 수요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오히려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중 경제공사를 지낸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여지는 충분히 있는 만큼 중국과 일대일로에 포함된 중앙아시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비교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 지역 확대에는 이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