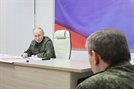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
몇 년 전 주 40시간 근로가 자리잡으면서 토요일은 이제 직장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됐다. 가족과 함께, 또 취미 생활로,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며 휴식과 여유를 갖는다.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환영 일색이던 '회사 놀토'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학교 놀토'가 어린 학생을 가진 부모나 학교의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걱정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쏟아졌다.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며 언론은 공교육을 압박했다. 교육 당국은 토요 프로그램 개발에 초 비상이 걸렸다.
개학하자 교육 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준비 소홀로 학교 토요 프로그램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노는 시간이 오히려 줄었다고 불만이다. 토요 수업을 안 하는 만큼 평일 수업 시간은 늘었는데, 정작 토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설 학원에 얽매여 있어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만큼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고, 일선 교사들은 업무 부담도 늘었는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다.
교육 당국은 놀토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가족 간의 유대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으로 주체적인 학습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학교 공부의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에너지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실은 교육 당국이 강조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놀토라고는 하지만 놀이터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원에 잡혀 있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다수의 지적처럼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도 지적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부모들이 놀토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노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심심하게 둬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이 짜놓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다. 토요일만이라도 아이들이 맘껏 놀면서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