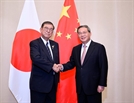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위기의 시간일수록 서로 연결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팔 대지진 발생 직후 이틀 만에 1,000만달러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금되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프로필에 남긴 말이다. 지난 4월 네팔을 덮친 강진의 참상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것도 구호의 손길을 모은 것도 다름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인터넷은 디지털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이어준다. 이를 통해 기술적 한계까지 뛰어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의 생체정보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 받는 길도 열렸다. 수집된 정보들을 정제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만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51.8%, 성인의 42.1%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또 정보통신망에 남겨진 기록들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악성 댓글,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 허위 사실 유포 등이 만연해진 상황은 외면하고 싶은 인터넷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인터넷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게 됐을까. 인터넷이 책임지지 않는 감정의 배설지가 되고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로 얼룩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찍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소통을 뛰어넘을 날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가 경고한 바보 천치들의 세상이 바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기술의 인본적 가치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의 물리적 발전과 개별 분야의 기능 강화에만 치중한 채 미래 인터넷 사회에 필수 요소인 융합과 소통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했던 탓은 아닐까 싶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각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연결 사회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덜컥거리며 부딪치는 다른 가치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CT 기술의 발전이 삶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이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인터넷 공간을 가꾸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988년부터 정부와 민간에서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포용의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래 인터넷을 떠받드는 핵심적 가치인 소통과 배려가 확산될 때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 다가설 수 있다. SNS 등 인터넷 서비스가 앞서 언급한 네팔 사례에서와 같이 지구적 손길을 연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인터넷의 인본적 활용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미래 인터넷이 나아가야 할 인간 중심 사회의 지표가 돼야 한다. 기술을 인간답게 사용할 때 미래 사회에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