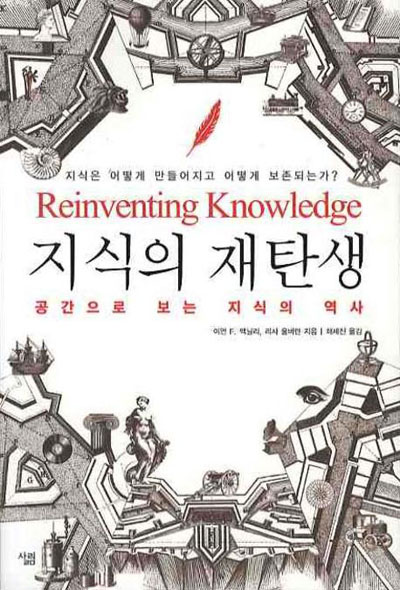|
시대가 변하면 기존의 지식 기관은 도태되고 새로운 지식 기관이 부상한다.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을 뒤져 책을 찾아봤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게 보통이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신속하다는 강점이 있다.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누리꾼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반해 정보를 축적해가는 것이나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이 유수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책 스캔작업을 진행해 거대한 전자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시도 등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지식의 판도가 변화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의 인터넷처럼, 지식을 보존하는 공간의 출현은 예전에도 지식의 역사에서 큰 분기점이 됐다. 책은 이렇게 지식을 형성하고 전달해 온 핵심 기관들에 대한 연대기다. 도서관, 수도원, 대학, 서신공화국, 전문학교, 연구소 등 “인간이 만들어낸 6개의 주된 공간이 지식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는 주장 아래 이들의 역사를 통해 서구 지적 전통의 흐름을 짚어본다. 부제는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 기원전 3세기 무렵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데메트리오스는 세상의 지식을 집대성하겠다는 야심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그리스의 지적 전통이 휴대 가능한 유산으로 변모했고, 말하기 중심에서 텍스트 위주의 학문 문화로 바뀌었다. 수도원은 문명이 붕괴를 거듭하는 수세기 동안 학문을 보존했고 시간의 표기와 측정을 연구했다. 중세 말에 이르면 대학이 수도원을 대신하게 되는데 도시의 탄생과 함께 파리는 신학, 볼로냐는 법학, 프라하는 인문학으로 이름을 날리며 지식의 재정비와 공간의 재배치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형체는 없으나 서신 교환 네트워크로 이뤄진 ‘서신 공화국’이 성행하면서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새로운 지식인의 탄생이 이뤄졌다. 지식 기관의 성립과 대체가 인류의 지성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독특한 접근이 흥미진진하면서도 진지하다. 1만3,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