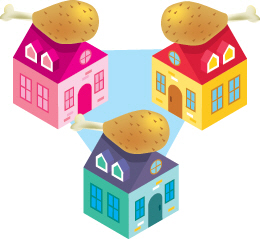|
얼마 전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동네 슈퍼에 갔다 깜짝 놀랐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중년 부부 대신 어느 젊은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 주변에 편의점이 세 곳이나 생겼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지만 작별 인사도 없어 떠나보낸 아쉬움이 남는다. 하기야 최근 사라지고 변한 곳이 어디 이곳뿐이랴. 골목 어귀에 있던 맥줏집도 단돈 5,000원에 행복을 주던 한식당도 어느 순간 카페와 중국집으로 모습을 바꿨다.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널렸는데 이들은 또 얼마나 버텨낼지 걱정부터 앞선다.
예전에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동네에 기껏해야 음식점·다방이 한두 곳밖에 없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전자상가단지로 변한 1970~1980년대 서울 용산의 청과물 시장 모습도 그랬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카페요, 치킨집이요, 음식점이다. 그러다 보니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카페와 치킨집이 5~6곳씩 보이는 것도 다반사. 일자리를 찾지 못한 'N포 세대'의 청춘과 은퇴는 했으나 아직 힘이 넘치는 실버 세대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생계형 창업밖에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사상 최대인 381만개에 달했다는 통계보다 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네 동네 풍경이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무려 3만6,000개나 돼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소식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치킨집뿐이겠는가. 상당수의 생계형 창업자들이 목적을 갖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어 장사에 나선 이들이다. 그러니 5년 생존확률이 30% 정도 안될 밖에. 오죽하면 수많은 치킨집과 가게들이 과열 경쟁으로 문을 닫는다 해 '버뮤닭 삼각지대'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그럼에도 생목에 거미줄 칠 수야 없기에 나왔을 터. 이 시대의 청춘과 부모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송영규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