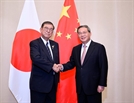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정부 주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지갑을 닫았던 남성 및 50~60대를 끌어모았고 이들은 행사 기간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다. 이 같은 현상을 업계에서는 '불황 탈출'을 상징하는 체감지표로 분석한다. 오랜만에 나온 친유통 정책에 발걸음을 되돌렸던 사람들까지 화답했다는 것은 심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케 한다.
실제로 심리와 소비의 연관성은 생각 외로 밀접하다. 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던 우리 내수 시장은 중기 적합업종 선정 등 대형 유통업계에 부정적 인식이 퍼진 지난 정권 후반부 이후 얼어붙었다. 대형 마트는 영업규제 이후 줄곧 역신장이고 백화점과 홈쇼핑, 아웃도어 업종은 수수료 논란 후 곤두박질쳤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면세점 독과점 문제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동산을 제외한 주요 업종들 대다수도 독과점 상태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대형 업체만 살아남는 '규모의 경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만이 원인이라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이 많으니 신제품을 내지 말라는 논리나 다름없다.
유독 유통업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대척점에 소상공인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소상인들은 결코 '거리'에 있지 않다. 이들 대다수는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거나 물품을 납품한다. 대형업체가 외면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다.
정부의 내수 발전 방안도 이제는 '대기업 트라우마'를 걷어내야 한다. 국내 자영업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매해 70%씩 성장하다 3년 내 90% 이상 소멸되며 '자영업 실종' 시대로 이어졌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종이 이를 대신했는데 이 중 재계약률 1위 업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중심의 편의점이다. 실제로 기술 경쟁력 발달과 대량 수급에 따른 가격 인하 등으로 유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 비중은 줄어든다. 소비 시장의 '우산'이 돼야 할 대형 업체를 계속 배척하기만 한다면 자영업은 갈수록 추락하고 재취업은 나날이 힘들어지며 소비는 더욱 줄어드는 '내수 절벽'만 굳건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무조건적 대기업 기피보다 그 틀에서 이뤄지는 고용의 형태 및 역할에 대한 감독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모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새로운 기업의 성장도 가로막고 독과점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모순마저 만든다고 항변한다. 결국 '시장의 역할'을 배제한 정부 규제란 시장을 왜곡시킬 뿐 성장에도 보호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수출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내수 시장에 필요한 것은 표심을 향한 상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선진화를 회복하기 위한 성장성 상생이다.
김희원 생활산업부 차장 heew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