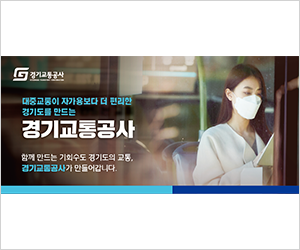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
지난 2015년 10월12일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소비자 행동 분석과 빈곤 연구에 대한 공로로 스웨덴 노벨위원회로부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때마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출간한 '21세기 자본' 열풍으로 불평등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불평등 해법에 대해 피케티와 견해를 달리하는 디턴 교수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경제 성장의 힘을 낙관하는 학자답게 지난 20~30년간 경제가 성장하면서 극심한 빈곤은 상당히 줄었다며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인터뷰 끝부분에 한국인들의 주목을 끌 만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국의 불평등 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디턴 교수의 대답은 다소 뜻밖이었다.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빈부 격차 문제는 유럽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을 본업으로 하는 석학이 세계 9위 무역대국의 상황도 모른다고? 디턴 교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나라인 만큼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디턴 교수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서구인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세계적인 석학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휴대폰 등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고 K팝 열풍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로 외교부가 지난해 17개국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집트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사정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0%의 미국인이 "한국이 아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하기야 미국 언론에서 연일 등장하는 뉴스가 북한 핵과 같은 좋지 않은 소식이다 보니 미국인들이 북한과 남한을 혼동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상품의 디스카운트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후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삼성과 현대차·SK·두산 등 대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돋움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와 반도체·휴대폰 등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에 걸맞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값은 고사하고 오히려 디스카운트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품질 면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제품에 뒤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디스카운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해답은 국가 브랜드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외국의 경우 국가 브랜드 개발을 국력 신장으로 연결시킨 사례가 많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개념을 상품화해 책이나 영화·게임 등을 만들어 세계에 유통시켰다. 사실 사무라이는 전쟁에서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줬지만 일본은 여기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아 소개함으로써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할 만한 훌륭한 자산이 많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잘 전달할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개발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철수 성장기업부장(부국장)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