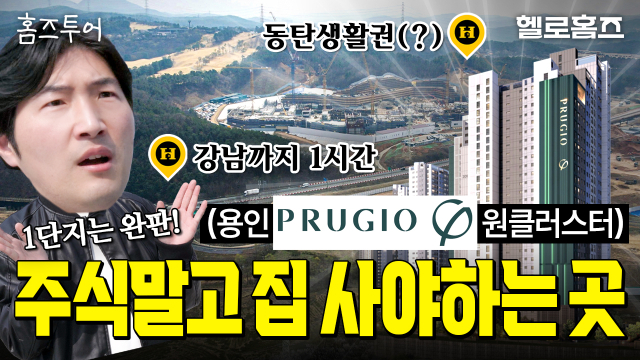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른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최근 2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군에 입대한 복수국적자는 30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한국인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적이탈 복수국적자는 특히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금수저’라는 점에서 일반인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78명, 지난해는 10월 기준 626명으로 최근 2년간 1,704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만 18세 이하인 군 미필자였다. 병역 의무를 마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온 뒤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2014년~2015년 10월 병역 의무를 지기로 결심한 복수국적자는 30명에 불과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수국적자 복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우리 군에 입대한 복수국적자는 19명, 지난해는 10월까지 11명에 불과했다. 군대를 가지 않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복수국적자의 56.8배에 이르는 것이다.
복수국적자 군인 수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Daily Beast)가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보도(2014년 7월 23일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만 1,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복수국적자 군인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군인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데 복수국적 군인은 130배에 이르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포기는 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어서 ‘흙수저’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 때 4급 이상 고위공무원 26명의 자녀 30명이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복수국적자들이 완전한 외국인으로 살아갈 생각도 없이 순전히 병역 회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모가 미국에서 출장 중에 태어나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부하다가 군대에 가야할 즈음 국적을 이탈한 뒤 재외동포비자 등을 받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아예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현역 육군으로 국방 의무를 마친 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모(26)씨는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뒤 한국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은 친구가 2명 있다”며 “그 중 한 명은 영어를 잘해 한국에서 취업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변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의무를 다 해도 살기 힘든데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고 취업도 쉽게 하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제도 악용을 막지 못하면 향후 대규모 병력 자원 이탈도 우려된다. 10세 미만의 남자 복수국적자는 2011년 1,988명, 2013년 5,825명, 지난해 6월 8,955명으로 4년 새 4배 넘게 뛰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원정출산자는 국적이탈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를 원정출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없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역미필 국적이탈자에 대해 한국에서의 영리활동 등을 제한할 장치도 사실상 전무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에 비자발급 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꺼이 군대에 입대한 30명은 현재 보충역 한 명 없이 육군 소총수, 해병대 운전병 등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등 남미 국적을 가진 이들이 18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신은 9명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