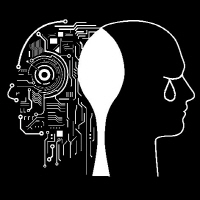|
오늘날 키보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쿼티(QWERTY)' 자판. 1873년 이 자판이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용도는 타이핑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당시 타자기는 피아노처럼 알파벳 28자를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타이핑을 빨리 하다 보면 글쇠가 엉키는 경우가 많았다. 쿼티 자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th'나 'a' 등을 위해 t, h, a 문자들을 세개의 단에 따로 배치하면서 오른손잡이가 치기 힘든 왼쪽으로 몰아넣어 타이핑 속도를 줄이고 엉킴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기 성능이 개선되고 이용자가 자판 배열에 익숙해지면서 타이핑 속도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급속히 빨라졌다.
쿼티 자판처럼 발명품이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발명가의 의도와 사회적 용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처음 만든 축음기가 대표적인 예. 에디슨은 축음기 테스트를 할 때 노래를 녹음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음악 재생용으로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축음기를 주크박스로 만들어 팔 때도 그는 이 기계가 유언 등을 기록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예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가 축음기를 음악 재생용으로 인정한 것은 발명 후 14년이나 지난 1891년이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둔갑하면서 그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것은 발명이 만들어낸 흑역사다.
최근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조만간 인간의 거의 모든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경고가 나왔다. 인류의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그 효용성 때문에 인간이 위협받는 아이러니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어쩌면 얼마 안 있어 세상이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로 가득 찰지도 모르겠다. 일하지 않는 삶,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송영규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