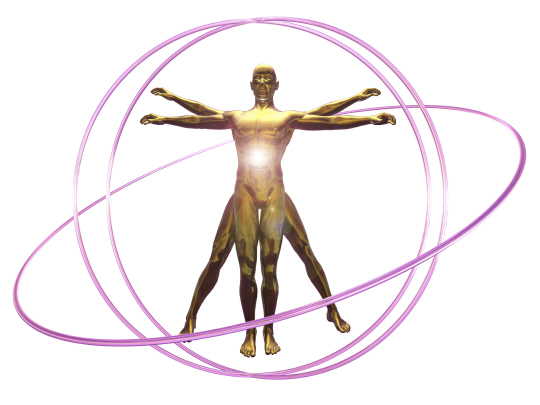|
융복합 문화콘텐츠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네오 다빈치' 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다빈치,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는 중세시대를 넘어선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다. 화가이자 철학자·과학자·엔지니어이기도 했던 그는 중세의 평면적인 시각 너머 종합적인 인식을 가졌다.
중세 회화의 목적은 신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림들이 단조롭고 형식적인 것은 그 때문이다. 다빈치는 이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인간을 목적으로 했고 실제 그대로의 사회를 표현하려 했으며 이에 걸맞은 회화기법을 사용했다. 다빈치가 실제와 비슷한 질감을 표현하고자 물감을 직접 만들어 썼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도 했다. 발명품 스케치, 해부학 연구, 건축 설계, 비행수단 구상, 광학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 몰두했다. "과학적 지식 없이 실습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방향키나 나침반 없이 배에 오르는 조타수나 다름없다"고 말한 다빈치의 생각을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서양에 다빈치와 같은 르네상스맨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문사철(文史哲)' 통합의 문화가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의 업적도 철학과 맥이 닿아 있었으며 조선 후기 지식인 정약용도 철학을 그 중심에 뒀다. 문화콘텐츠의 융복합을 강조하는 한 전문가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과 기술(과학)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면서 "서양의 '필로소피(philosophy)' 개념이 들어오고 이것을 근대 일본에서 '철학'으로 번역되면서 철학과 기술이 마치 처음부터 다른 분야인 것처럼 오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대 로마시대 작가인 오비디우스가 쓴 '아르스아마토리아(Ars Amatoria, 'Ars'는 영어 'Art'의 어원)'가 우리말로는 '사랑의 기술'로 번역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예술과 기술은 같은 표현이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생기면서 '테크놀로지(technology·기술)'가 분리됐고 '아트(Art)'는 그냥 예술로만 남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의 지나친 세분화·칸막이는 이제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융복합 부각은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