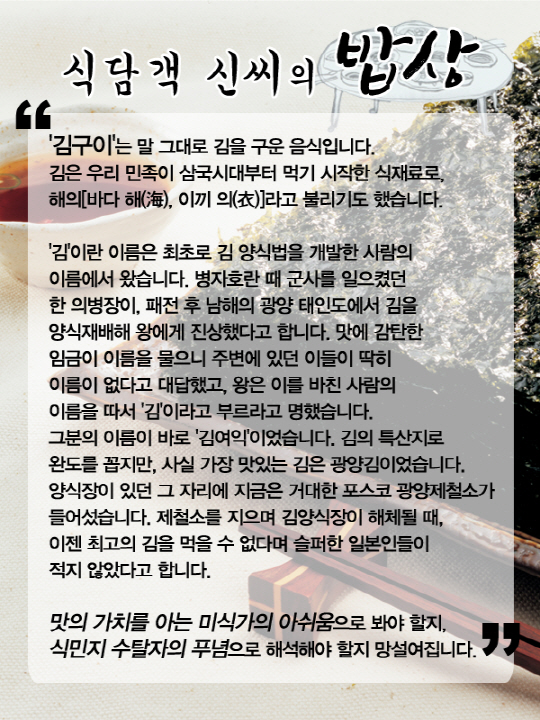2004년 봄, 아직 식품회사 신입사원 풋내가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마케팅실장님께 조간신문 스크랩을 전달하고 오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도와줘라.”
마케팅실 장 대리님입니다. 소주와 사람과 씨름을 좋아하는 선배로, 입사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이번에 김이 새로 나왔는데, 신문에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크게 주목받을 제품이 아닌 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제품 특징은 뭔가요?”
“응, 어린이용 김인데, 크기가 작아. 그래서 아이들 입술에 안 묻어, 짜지도 않고.”
“그럼 그냥 작은 김인가요?”
선배의 설명에 활기가 붙습니다.
“애들 김에다가 밥 먹이다 보면, 일반 김은 너무 커서 자주 입술에 묻고 쓸려. 그래서 작게 잘라서 밥에 싸주는데, 그러려면 손에 기름 묻고 크기도 제각각이야.”
“불편하겠네요?”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첨가성분이나 영양소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들으며, 포인트가 크기에 있다는 데 공감이 갑니다.
“대리님, 그래서 제품 이름은 뭔가요?”
선배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우리 아이 돌돌이 김!”
“이름 참 간결하네요. 스무 자도 안되고.”
“짓다 보니 그렇게 됐다.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어?”
“이 제품은 대리님이 아들에게 김으로 밥 싸 먹이다가 착안한 것 같군요. 아버지의 부성애로 만든 제품이네요.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장 대리님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 셈이지. 아니, 그렇지.”
그렇게 보도자료를 써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많은 매체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특색있고 재미있는 제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이었을까요?
장 대리님은 툭하면 홍보실에 들러 김을 주시고 갔습니다.
“고맙다, 식구들이랑 먹어봐.”
“새로 나왔다, 먹어.”
“심심하지? 먹어라.”
그렇게 장 대리님은 아주 오랫동안 ‘은혜 갚은 까치’처럼 수시로 보은을 했습니다.
김 먹자고 쓴 자료가 아닌데. ^^;;
불현듯 시골에 살던 꼬맹이 시절이 떠오릅니다.
동네 굴뚝에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 오르면, 뛰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마른 김에 들기름을 바르고 계시면, 이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석쇠에서 노릇하게 김이 익으며, 고소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새끼 고양이처럼 밥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형제에게, 어머니는 김을 조금씩 뜯어주시곤 했습니다.
아직 뭔가 아쉽지만, 이제 곧 더 맛있는 걸 먹겠다는 기대감이 몰려옵니다.
정말 김이 맛있는 순간은 밥을 싸먹을 때입니다.
갓 구운 김에 막 지은 밥.
향긋한 바다 내음과 고소함, 담백함에 옅은 달콤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집니다.
참기름을 떨군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무뚝뚝한 식구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다정함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비싼 고급 김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네요.
젊고 활기 넘치던 1982년의 엄마가 그리운 듯합니다. /식담객 analogoldman@naver.com
식담객 신씨는?
학창시절 개그맨과 작가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언론 홍보에 입문, 발칙한 상상과 대담한 도전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어원 풀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업 알리기에 능통한 15년차 기업홍보 전문가. 한겨레신문에서 직장인 컬럼을 연재했고, 한국경제 ‘金과장 李대리’의 기획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PR 전문 매거진 ‘The PR’에서 홍보카툰 ‘ 미스터 홍키호테’의 스토리를 집필 중이며, PR 관련 강연과 기고도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홍보 바닥에서 매운 맛을 본 이들의 이야기 ‘홍보의 辛(초록물고기)’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