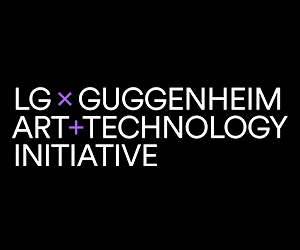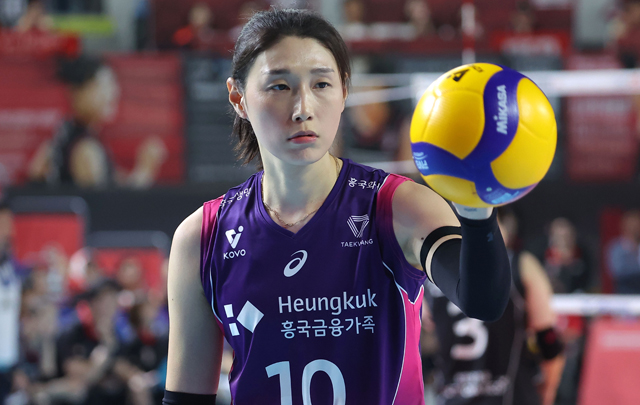전경련만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게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는데 메스를 들이대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생긴 결과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년 50억달러가 넘는 기술무역적자를 내는 것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이 초래한 비극이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한국 경제에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생산의 부가가치 제고를 이뤄야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위기 요인으로 경제는 경제개혁 지연을, 기업은 신산업과 핵심기술 역량 미비를 꼽았다. 옳은 지적이다. 세계 경제가 살아난들 경제 체력이 바닥이고 경쟁력도 낮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개편,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개발로 혁신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효율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자원 낭비로 체질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보다 작금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