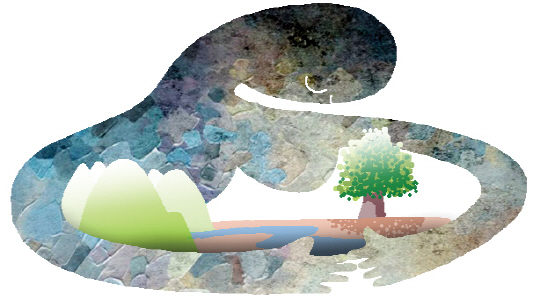어머니가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강물의 물살이 지친 물새의 발목을
제 속살로 가만히 주물러주듯
품어야 산다
폐지수거하다 뙤약볕에 지친
혼자 사는 103호 할머니를
초등학교 울타리 넘어온 느티나무 그늘이
품어주고,
아기가 퉁퉁 분 어머니 젖가슴을
이빨 없는 입으로 힘차게 빨아대듯
물새의 부르튼 발이
휘도는 물살을 살며시 밀어주듯
품어야 산다
막다른 골목길이 혼자 선 외등을 품듯
그 자리에서만 외등은 빛나듯
우유배달하는 여자의 입김으로
동이 트듯
품는 힘으로
안겨야 산다
다짜고짜 ‘품어야 산다’니 너무 지당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성현이나 사제의 말씀인 줄 알았다. 거미가 제 등을 헐어 새끼에게 먹이듯 무조건적 자기 희생의 어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만이 품는 게 아니라, 아기가 퉁퉁 불은 엄마 젖을 빨아대는 것도 품는 것이었구나. 강물만 물새의 발목을 주물러주는 게 아니라 물새도 물살을 밀어주고 있었구나. 골목이 외등을 품고, 외등이 골목을 빛내고 있었구나. 품는 것이 안기는 것이었구나. 안기는 것도 품는 것이었구나. <시인 반칠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