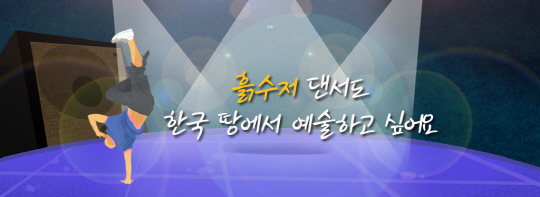홍대 앞 반지하에서 출발해 올해 창립 20주년으로 시총 5,478억 회사를 일궈낸 YG 양현석 대표. 양 대표는 원래 가수 ‘현기획’으로 출발한 댄서 출신 CEO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전세계 순회 공연을 통해 세계인에게 新한류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비보이’ 댄서들. 최근 국내에서 열린 ‘세계비보이대회’에 1만 5,000명의 관중이 모일 정도로 비보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비로 1억원을 들인 비보이 팀이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비주류에서 한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까지 ‘순수창작자’들은 한국 경제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엔 ‘흙수저당’이란 예술인 권익 보호 청년 단체가 생길 만큼 한국 예술계에서 흙수저로 성공하기는 절대 녹록치 않다.
올해 사상 최대 7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문화재정에 투자하며 ‘문화 창조’를 외치는 한국. 과연 지금 ‘새로움’을 꿈꾸는 이들에게 한국 텃밭은 어떤 상황일까.
단국대, 세종대, 한예종 style? 틀에 박힌 춤 만드는 대학
댄서계에서 정통 이너서클이 똬리를 트는 것은 대학 입시부터 시작된다. 어린 나이에 재능을 확인한 꿈나무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 대학이나 단체를 알아보지만 보통 ‘순수무용’이라 불리는 고전 발레, 현대, 한국 무용 등 주류 댄스 수업이 대부분이다. 주로 정통 댄서들이 심사하는 기준에 맞게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댄스 스타일은 시도하기 쉽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품비’를 대는 돈만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기도 한다. 돈이 없고, 전통 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되는 셈이다.
김재용(30) 서울댄스컴퍼니 대표는 “대학 교수에 맞는 작품 스타일이 따로 있다. 그 제자들이 입시 준비생들에게 작품을 주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원로 댄스가 원하는 교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싼 돈을 들이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유명 발레단이나 무용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업자로 전락한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대학 무용학과는 축소, 폐지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재능은 있지만 작품을 준비할 돈이 없는 준비생들은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민간단체를 꾸리거나 개인 활동을 한다. 김 대표는 “모던 발레·비보이·팝핀·락킹·밸리 등은 비주류로 불리고 댄스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 장르는 새로운 댄스 스타일로 한류를 알리는데 1등 공신들이지만 ‘전통’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아주 적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신진 세력 거부하는 ‘그들만의 리그’
국내 등록되어있는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총 824개.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는 총 17개로 100% 재단법인으로 구성돼있다. 다른 재단, 사단,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국고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부 ‘전통·순수’ 장르만 모집해 신규 창작 단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재단을 통해 국고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신규 창작 안무는 진입 장벽이 높아 늘 받는 단체만 받는 관습이 팽배하다. 무용수 이기수(32)씨는 “국고를 받으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를 통과해야 하지만 실용 무용은 해당도 안될 뿐더러, 고전 무용이라 해도 기존에 받고 있던 단체를 뚫고 신규 단체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방송프로그램 ‘댄싱9’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 댄서 김설진(36)씨는 “대부분의 비보이들은 정부 지원은 생각도 못한다”고 말했다.
문화 보존 하려다 ‘고인 물’ 되는 법인들
재정지원을 받는 소수의 기득권 예술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다. 공연장에 사람이 없어도 국가 보조금 만으로 유지가 되니 새로운 무용 발굴이나 신규 수익 모델을 찾는 데 소홀하다. 그나마 대부분의 수입도 자체 기획 공연이 아니라 공연장을 빌려주고 대관료를 받는 대관 공연에서 나온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 백서(2015)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연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521개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공연실적 중 자체기획, 제작 공연이 12.2편, 행사참가, 초청공연이 11.9편, 대관 공연이 73.7편으로 자체 수입의 대부분은 ‘대관 공연’ 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최재진 공연기획감독(31)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연장에 티켓 파워를 만들어 내는 건 대중 예술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장의 대관 방식은 아티스트가 직접 공연 기획, 무대 제작까지 거쳐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신규 단체들이 스스로 공연을 이끌다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장르를 개발하지 못하고 지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무용전공 학생 이해영(24)씨는 “국고나 지자체 후원을 받는 대학로의 좋은 공연장이 있다. 관객이 외면하고 객석이 비어도 공연을 한다”고 말했다.
국고금 ‘공모’를 통해 순수·대중 작품끼리 경쟁시켜야
한류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신진 창작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선 국고금 지원 자격부터 바뀌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중 문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규 장르를 알아보고 이들이 직접 공모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 공모를 통하면 이미 그 단체도 이너서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창작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전통과 신규의 자율 경쟁을 통해 양 장르가 상호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웨스트 엔드의 경우, 정부에서 공공 공연장을 만들고 이 곳에 정부 자금을 투자해 신규 창작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뒤 흥행에 성공하면 상업 공연장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주변 공연장에서 순회 공연을 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런던 서부 부시시어터는 그동안 발굴해 낸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이 2,000편을 넘기기도 했다. 한 아트센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자하는 통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주변 생태계가 긴장한다며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장르를 키워 문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