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 서민우 기자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특조위’ 국민연금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던 정재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장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의 눈에도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정 팀장은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는 핵심 운용역이다. 법대 출신답게 명확한 논리와 회계·재무 지식까지 겸비해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사흘 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날 때 동행한 세 명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이 날 정 팀장은 일생에 겪을 억측을 모두 겪은 듯 보였다. 다짜고짜 “왜 그날 이재용을 만나야 했냐”고 따지는 의원부터 “불리한 합병비율을 알면서도 합병을 찬성한 경위가 뭐냐”, “지난해 7월 내부 투자위에서 표결에 기권한 위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까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이 모두 그에게 쏟아졌다. 정 팀장의 답은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다. “기금본부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 기업 총수를 만난 건 이번 만이 아니다”, “통합 법인의 미래가치가 불리한 합병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봤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주식시장에서 밸류에 대판 평가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위라는 집단 의사결정 체제를 두는 이유”라고 그는 힙겹게 항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건 됐고”였다. 그들의 머릿 속엔 기금본부에 이미 외부 입김이 작용했고 국민연금은 재벌기업과 비선 실세에 부역했다는 프레임으로 꽉 차 있었다. 아무리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도 아예 무시돼 버린다. ‘불통의 벽’에 갇힌 국회의 분위기에 그의 속은 불편했고 기금본부 직원들도 마친가지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건 이후 우리 공직사회는 논쟁적인 사안이나 책임질만한 결정은 회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2016년 11월 이제는 ‘삼성물산 신드롬’이 543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본부에도 뿌리 내릴까 우려된다. 의혹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기금본부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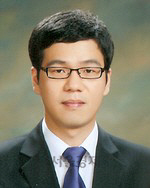

 ingaghi@sedaily.com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