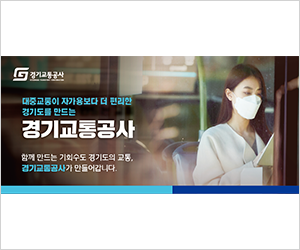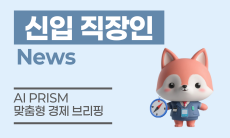1970년 4월24일 오후 1시35분, 중국 간쑤성(甘肅省) 주취안(酒泉) 우주기지. 길이 29.86m짜리 창정(長征·Long March) 1호 로켓이 솟아올랐다. 창정 1호는 발사 13분 뒤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 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다.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둥팡홍 1호는 중국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인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혁명가요를 28일 동안 송출하며 서방세계로부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이로써 구 소련과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던 세계는 놀랐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로켓 제작 기술을 낮게 판단한 이유는 간단하다. 원천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이가 좋던 시절 소련이 제공한 R-2 로켓을 분해하고 역설계하면서 로켓을 만들었다. 소련의 R-2도 원형은 나치 독일이 2차대전 중에 써먹었던 독일 V2 로켓. 각국 정보기관들은 중국의 인공위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일본 언론들이 특히 관심이 많았다. 무엇보다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우려는 근거가 있었다. 대형 로켓에 인공위성을 달면 위성 발사체가 되고 핵탄두를 달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니까. 더욱이 일본은 불과 2달 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일본 기술력이 개가를 거둬 아시아 유일의 우주 국가가 됐다’고 우쭐해 있던 터. 중국이 바로 따라왔으니 관심이 컸다. 일본 매체들은 발사 이전부터 기술적 난제가 많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써댔다.
일본의 저주 섞인 전망과 달리 결과는 대성공. 내용도 좋았다. 일본은 4전5기를 거치며 다섯 번 시도에서야 경우 성공한 반면 중국은 첫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거뒀다. 무게 역시 173㎏으로 구 소련이 1957년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보다 2배, 일본이 간신히 성공한 오수미 위성(24㎏)보다 7.2배나 무거웠다. 일본이 중국보다 한발 앞서 인공위성을 날렸지만 로켓의 추진력에서는 중국이 몇 수 위라는 얘기다. 다섯 번째 위성발사 국가이지만 실력은 3위라는 분석이 바로 나왔다.
미국과 소련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핵과 인공위성 개발에 나섰던 중국은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침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던 미·소전략무기제한협정(SALT) 협상에서도 중국 핵 무기가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은 이때부터 중국을 확실한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전략무기까지 개발한 중국이 소련을 능히 견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듬해 핑퐁 외교(탁구 국가대표팀 상호 방문)로 시작된 양국 관계는 1972년 초 미·중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인공위성 발사는 미·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였던 셈이다.
북한 김일성이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는 북한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말 ‘최초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할 때도 중국의 선례를 많이 따랐다. ‘혁명 가요’를 송출한 점도 같았고 로켓을 여러 개 묶어 추진력을 높인 점 역시 창정 1호 등장 이후 중국의 로켓 발달사를 닮았다. 당시 북한은 추진체를 인공위성 발사용 장거리 로켓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대포동 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창정 1호의 성공은 거대한 시작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우주기술은 유인우주선 발사를 넘어오는 2020년 우주정거장(天宮)과 달기지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주에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도 꼽힌다. 자신감에 찬 중국은 ‘우주전쟁은 필연’이라고 말할 정도다. 관련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창정 1호(LM-1)로 시작된 중국의 로켓은 수십 가지 변형을 낳으며 민간 상업용 위성 발사에서도 수주를 따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3,300t의 추진력을 내는 LM-9를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은 어떻게 놀라운 성공을 거뒀을까. 국가의 지원도 많았지만 답은 ‘사람’에 있다. 중국의 1세대 원로 과학자 중에는 안락한 미국 생활을 버리고 귀국해 열악한 급여와 연구환경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지난 2009년 타계한 첸쉐썬(錢學森)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비 유학생 출신으로 2차 대전 중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는 미국이 ‘해병 5개 사단에 버금가는 과학자’로 평가했던 인물. 36세 나이에 MIT 최연소 종신 교수직을 제의받은 적도 있다.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던 첸 박사는 매카시즘 광풍이 휩쓸던 1950년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구류처분과 비밀 인가 취급 권한을 취소 당한 뒤 ‘아메리칸드림’을 버리고 귀국을 결심했다. 미국은 그의 귀국과 서류 반출을 막았다. 반 억류 상태인 5년간 그는 중요한 자료를 머릿속에 외우며 귀국 후를 준비했다. 미국과 중국은 1955년 비밀 교섭을 통해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잡은 공군 포로 11명과 첸 박사를 맞바꿨다. 중국에 돌아온 그는 로켓과 핵폭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중국의 군사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인들의 속을 쓰리게 만들었다.
중국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할 때마다 미국 언론은 첸 박사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매카시즘에 홀려 미국 스스로 종아리를 때렸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중국에 돌아온 첸 박사는 흔한 계산기 하나 없고 5층짜리 연구소에 전화기가 단 한 대뿐인 환경에서도 중국의 우주 개발을 최소한 20년 앞당겼다. 연구 단지의 사원 숙소에 머물던 첸 박사에게 당국이 저택을 내리자 ‘이미 인민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다. 귀국(1932년) 할 때 실험설비를 자비로 구입해 국가에 바쳤던 자오중야오(趙忠堯·1998년 사망)는 직접 만든 비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핵물리학자들을 길러냈다.
중국이 외형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쓰면서도 훨씬 많은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는 이런 연구 토양이 있다. 일찍부터 인재를 키웠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1940년대 국공내전 시절부터 중국은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경쟁적으로 인재를 해외에 내보내 배우게 만들었다. 최소한 사람을 키우려는 장기 안목이 있었다는 얘기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이공계 유학생들은 해마다 2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1세대 과학자 그룹 이래 전통으로 굳어진 ‘국가와 인민을 위한다’는 신념이 그들에게는 있다.
미국 유학을 앞둔 24살의 첸쉐썬에게 부친은 ‘출국하기 전에 중국의 역사와 고전을 읽으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충성도 불가능하고, 조국의 역사를 정독해 다져진 인생관이 없는 자연과학은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할까. 첸 박사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고소득 기능공’보다는 탐구하는 과학자로 생각하라“라고 주문하며 “공학 과목만 듣지 말고 인문학과 수학, 화학, 물리 같은 과목도 수강해야 한다”라고 권유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매카시즘에 빠져 첸 박사를 내쫓았던 미국과 한국은 다를까. 우리 유학생과 과학자들에게도 중국 1세대 과학자들과 비슷한 열정이 있을까.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일수록 돌아오기보다 현지 사회에 편입돼 노란 미국인으로 살아간다. 심지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치했던 해외 두뇌들마저 10.26 이후에 ‘열악한 연구 환경’을 탓하며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 중국 영재들은 물리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의 수재들은 의대에 몰린다. 영재들이 ‘고소득 기능공’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지 걱정이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