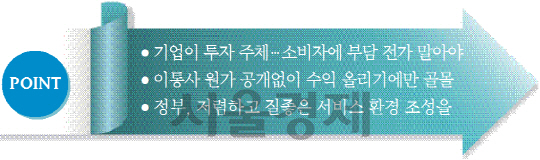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첫 번째인 통신기본료(1만1,000원) 폐지 문제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추진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정부에 가격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사업자들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통3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7조원 수익이 줄어 사업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5G(5세대)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가 어렵다고 은근히 국가와 국민을 압박한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알뜰폰 업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기보다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파사용료의 감면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추세다.
통신기본료가 무엇이길래 이리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일까. 통신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망 구축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단체는 이미 망 구축이 끝났고 통신 3사는 막대한 이익을 낸 만큼 기본료를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과연 망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의한 통신망 투자는 지난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돼 공사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현재 KT)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통신공사는 신규 전화시설 구축을 위한 통신망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가입자마다 20만원을 상회하는 채권을 발행했다. 무선망에 대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1984년 통신공사의 자회사로 출발한 한국이동통신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채권을 발행해 이동통신망을 구축했다. 그 이후 민영화의 과정을 거치고 경쟁사업자가 생겨났으나 분명한 것은 초기부터 국민이 통신망 구축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의 위치를 누려온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대체 어디로 가고, 사용자인 국민이 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통신망 구축의 투자를 부담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주무부처는 통신 3사가 민영기업이므로 요금 정책에 간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영기업의 이익을 걱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정부의 정책이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계를 유지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이라면 통신망 투자를 결정할 주체는 통신 3사이고 그 수익성에 대한 책임도 통신 3사의 몫이다.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만일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으로서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근간이라면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의 원가에 기반한 적정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3사의 수익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 3사의 원가는 물론 적정이익률도 모르니 장님이 작대기로 코끼리를 그리는 격이다.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역시 원가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천하려면 정부의 통신사업자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산업으로 정립하든가, 아니면 완전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통신사업자 스스로 국민에게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정쩡한 정부의 상황을 통신 3사가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기본료 하나도 부담하지 못하는 국내 통신 3사가 통신시장이 완전 개방됐을 때도 살아남아 우리나라의 토종 통신산업 기반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