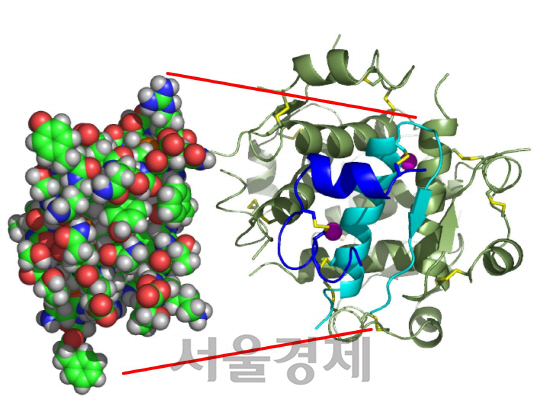1980년 6월 1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생명공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생명에 대한 특허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9년을 끌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칭송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화학과 제약, 종묘(씨앗) 회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바이오산업(BT)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생명 공학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대헌장: 1215년 제정된 영국 성문법의 모태)’라는 극찬도 나왔다. 반면 학계는 우려를 금치 못했다. ‘악마가 법복을 걸치고 대재앙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악평이 쏟아졌다.
소송의 시작은 1971년.제네럴 일렉트릭(GE)사의 인도 출신 연구원 ‘아난다 모한 차크라바티’ 박사(당시 33세)가 미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기름을 잡아먹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배양해내고 특허를 출원했으나 통하지 않자 법에 기댄 것이다. 차크라바티가 출원했던 특허는 미생물(박테리아) 제조 방법과 매개 물질 및 박테리아 등 세 가지. 특허청은 앞의 두 개는 심사할 수 있으나 박테리아는 발명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허청의 심사 거절은 이상할 게 없었다. 자연의 산물인 생명에 관한 것은 특허나 상품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비슷한 판례도 있었다. 연방 대법원은 1948년 종묘업체끼리 소송에서 ‘박테리아의 혼합물에 대한 특허는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이 판결 직후 생명 공학적 발명 또는 발견의 기대 효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특허 제도로 보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으나 차크라바티는 달랐다. 물러서지 않았다.
애써 연구해 특허를 신청했음에도 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자 차크라바티는 특허법원에 항소해 3대2로 승리를 따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특허청장 스탠리 다이아몬드가 항소했다. 차크라바티가 제기한 소송은 ‘다이아몬드 대 차크라바티 소송(Diamond vs. Chakrabarty)’으로 바뀌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차크라바티의 손을 들어줬다. 주임 대법관 워렌 버거는 최종 판결문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 is patentable).’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생명 특허는 바로 논란을 낳았다. 대법관들의 견해가 5:4로 팽팽했다는 점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때아닌 신앙 논란도 일었다. 워렌 버거 대법관의 판결문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는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과 상반된다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은 신의 영역이기에 인간이 법과 제도로 규정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이라는 반론도 일었다. 판결을 옹호하는 쪽은 ‘박테리아는 생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특허는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갔다. 양재섭 교수(대구대학교 분자생물학과)의 연구논문 ‘생명특허의 허용과 인간 존엄성의 문제’에 따르면 1980년 미생물이 대상이었던 생명특허는 하등동물을 거쳐 고등동물로 옮아가고 있다. 1987년 미국 특허청은 굴에 대한 생명특허를 일부 내줬다. 인공적으로 배수체를 조절해 사계절 출하가 가능하고 질병에도 강한 굴을 만들기 위해 염색체를 조작한 이 특허 자체는 기각됐으나 ’동물도 특허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1988년 암에 잘 걸리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onco-mouse 또는 Harvard mouse)를 만들어 특허를 따냈다.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특허가 인정됐다. 특허를 획득한 하버드 생쥐를 이용하려는 곳은 응분의 사용료를 하버드대학에 내야 하며 구입한 쥐의 번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이진경 교수(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는 소논문 ‘현대 자본주의와 생명의 권리’에서 이를 맹공한다. 암에 관한 동물 실험을 위한 유전자 변형 쥐는 생명력 자체가 자본에 의해 암적 형태로 변형된 존재다. 죽음을 위해서만 태어나는 생명이 착취 당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면 ‘생명산업이 아니라 죽음산업’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생명산업이든 죽음산업이든 대상은 동물에 머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의사들은 존 무어라는 환자에게서 특별한 항체를 발견해, 분리 배양한 뒤에 특허를 내고 상품화했다.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특허권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이 상업적 이득을 누린 사실을 파악한 무어는 병원을 고소했으나 1990년 법원은 병원과 의사들의 편을 들었다. 항체가 무어의 신체에서 형성됐어도 무어 자신은 항체를 변형 가공할 능력이 없기에, 특허의 소유권은 가공하고 상품화한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병원과 개인만 그럴까. 미국 국립보건원은 면역 기능이 강하다고 알려진 파나마 구아미족 원주민에게서 추출한 바이러스를 특허 출원하려다 원주민들의 반발로 포기했었다. 1995년 미국 특허청은 솔로몬 군도와 파푸아뉴기니 출신 주민에게서 추출한 면역 강화 바이러스의 특허를 승인했었다. 남태평양 군도 연맹의 항의를 받고 특허를 취소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 이후 빈국과 부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져 ‘유전자 제국주의’가 찾아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염병 등에 강한 인자를 가진 원주민 유전자를 국제 자본이나 대형 병원이 채취해 특허를 냈다고 치자. 인류는 새로운 신약을 손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병원체를 제공한 원주민도 비싸서 신약을 못 구하기 십상이다. 다국적 종묘회사들이 ‘우수하지만 씨앗은 없는 품종’을 보급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유전자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열심히 제품을 만들지만 특허료 등으로 이익이 빠져나가는 특허 식민지도 모자라 우리 후손들은 생명특허 식민지라는 오명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바이오테크 시대’에서 생명특허 자체를 우려한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내려놓는 행위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파우스트나 진배없다는 것이다. 생명특허는 과연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일까. 겉으로 보면 그렇다. BT 산업의 세계시장은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4,145억 달러에 이른다. 오는 2020년이면 1조 달러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이 앞선다. 생명연금술(Algeny)이 금을 만들어내려 시도했던 연금술(Alchemy)처럼 허망한 것이 아니기를,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구약성서 욥기의 구절(38장 11절)처럼 인류가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그러나 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어디인지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