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어는 점잖은 물고기라 여겨 글월 문(文)자를 사용하여 문어(文魚)라고 부른다. 그러나 서양에서 문어는 공포의 대상이자 ‘다름’의 대명사다. 이 때문에 쥘 베른의 ‘해저 2만리’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는 문어가 괴물로 등장했으며, 외계 물체는 대부분 문어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서양인으로서는 멀리하고 싶은 생명체이지만 저자인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 몽고메리는 이 이질적인 생물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의 한 수족관에서 처음으로 만난 문어에 매력을 느낀 저자는 이곳을 드나들며 문어 아테나, 옥타비아, 칼리, 카르마 등을 만났던 2년간의 ‘탐구와 교감의 기록’을 에세이로 펴냈다.
우선 서양인이 이질감을 느낀 것이 타당할 정도로 문어는 인간과 매우 다르다. 몸에 다리가 달린 인간과 달리 문어는 ‘머리에 다리가 달린’ 두족류인 것. 인간이 머리, 배, 다리 순이라면, 문어는 배, 머리, 다리 순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어 머리로 보는 부위는 인간으로 따지면 배에 해당되고 그곳에 각종 위장이 들어 있다. 심장은 세 개이고, 뇌는 목구멍을 감싸고 있으며 피는 푸른색인데다 끈적한 점액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게다가 수컷의 발 중 하나는 생식기에 해당되는 ‘교접완’이다. 아리스토텔스는 이런 문어를 두고 “수컷은 촉수 가운데 하나에 일종의 음경이 있는데, 암컷의 콧구멍을 넘나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가 문어를 ‘文魚’라고 쓴 것이 글을 읽을 줄 알 정도로 똑똑해서였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저자에 따르면 문어는 놀 줄 알고, 지능이 있는 동물만이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쿠아리움에서 저자가 관찰한 문어는 성격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가 하면,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장난감도 썼다. 문어의 높은 지능은 특유의 무방비하게 물렁거리는 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적의 마음을 읽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컸던 까닭이다. 게다가 문어는 감정이 있는 즉 교감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생물체다. 낯선 사람을 보면 피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이들은 기억하는 것. 또 인간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암컷 문어 옥타비아의 일화도 인상적이다. 옥타비아는 수정이 됐을 가능성이 낮은 알을 낳고도 수개월을 살뜰히 보살폈다. 알은 부화되지 못했고, 옥타비아도 극도로 쇠약해졌고, 병을 얻었고 노망이 들어 죽게 됐다. 1만6,000원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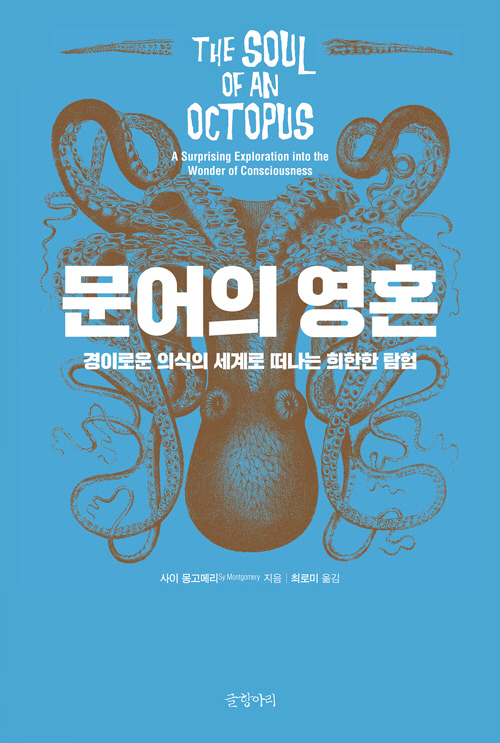
 yeonvic@sedaily.com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