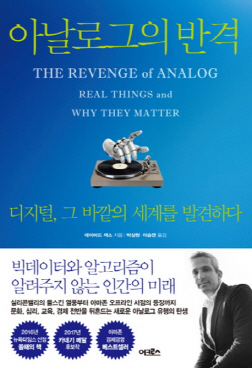우리가 상상하는 디지털 세상의 끝은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는 기술 진보는 어제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조지프 슘페터가 주창한 ‘창조적 파괴’의 신화 탓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정반대의 흐름이 존재한다. 컬러링북을 사서 색연필을 들고 색칠을 하며 희열을 느끼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동네의 인디 책방을 찾아 주인이 골라주는 책을 읽는 재미에 빠진 이들도 있다.
캐나다의 저술가인 데이비드 색스는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아날로그 상품과 아이디어가 인기를 끄는 현상의 원인과 가치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부터 미국 내슈빌의 레코드 공장까지 ‘아날로그 반격’의 현장을 부지런히 다녔다. 그러고 낸 결론은 아날로그의 득세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됐던 많은 옛것들이 지금도 널리 이용되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 한때 유물처럼 여겨졌던 LP는 1948년 세상에 나온 이래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LP에서 CD를 거쳐 MP3로, 스마트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디지털 음원을 듣는 일상 속에서, 외려 LP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07년 99만 장이던 LP 판매량이 2015년 무려 1,200만 장으로 늘었다. 전체 음반 판매 수입의 약 25%를 LP가 차지할 정도다.
저자가 꼽는 아날로그의 가장 큰 매력은 ‘즐거움’이다. 레코드판은 디지털 음원보다 듣기에 번거롭고 음질도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LP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감으로 느낀다. LP에 쌓인 먼지를 입으로 ‘후’하고 불어내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CD도 MP3도 줄 수 없는 참여의 기쁨을 온몸으로 누린다.
오늘날 아날로그의 유행이 디지털 생활의 피로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문화나 향수라거나 각종 아날로그 제품이 디지털의 보완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날로그 상품 구매층의 대부분이 젊은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라고 말한다. 어른과 달리 지금의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스크린을 터치하며 자란 세대다. 이들에겐 디지털 음원이 당연한 것이지만 LP는 새로운 유행이다. 과거를 소비하며 최신의 유행을 만끽하는 셈이다.
저자는 아날로그의 반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날로그가 돈이 되기 때문. 저자는 승자독식, 소득격차를 불러온 디지털과 달리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경제모델은 테크기업과 지역의 작은 가게나 공장의 이익 균형을 맞춰주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비즈니스 시장이 레드오션인 반면 아날로그 기술을 참신하게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은 비교적 블루오션에 해당,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하게 결합할 때 시너지가 난다는 것, 따라서 그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LP의 부흥 역시 이베이를 통해 수백만장의 앨범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시작됐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이 인간은 비어버린 두 손을 바라본다. 이제는 이 손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위에서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