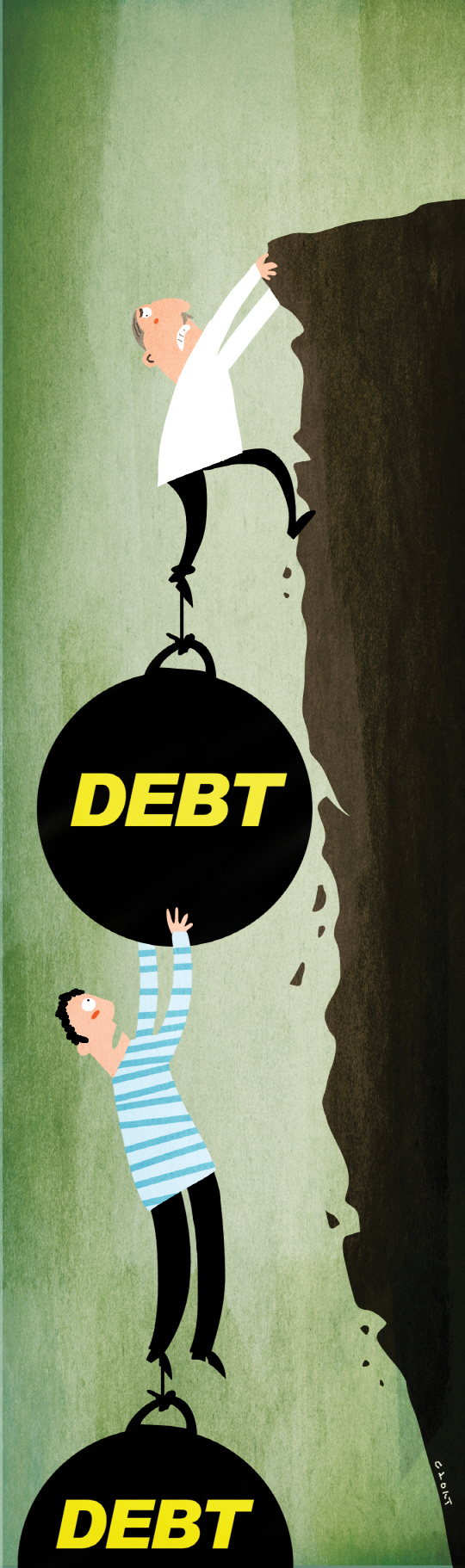일본 삿포로 아쓰베쓰구에 사는 80세 야스다 요시아키의 집에는 45세인 아들 아키오와 고등학생 손자까지 3대가 한솥밥을 먹으며 살고 있다. 야스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진데다 아들 역시 실직과 이혼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동거가 시작됐다. 야스다 앞으로 나오는 월 95만원의 연금이 있지만 집세 20만원과 난방비, 보험료 등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은 40만원 정도다. 결국 빠듯한 생활에 아키오는 일당 7만5,000원(식비를 제하면 5만원)의 파견직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그나마 벌이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 아키오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더해지면서 야스다의 생활보호 자격이 중지된 것. 이로써 야스다는 그간 면제됐던 의료비(진료당 3만원)와 시영주택 집세(월 20만원)를 부담하게 됐다. 하루 한 끼 식사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야스다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마저 끊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동거로 야스다는 오히려 방치됐다는 것이다. 아들은 야스다의 보호자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집을 비우고, 정작 보살핌이 필요한 야스다는 온종일 혼자 있다.
야스다의 사례는 ‘노후 파산의 현실’로 주목받았던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이 만든 속편 ‘친자파산을 막아라’에서 비춘 초고령사회 일본의 암담한 현실이다. 전작을 통해 장수가 재앙이 된 일본 사회를 비췄던 제작진은 이번에는 장수의 최초 희생자인 일본 고령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공멸하는 이른바 ‘노후 친자파산’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해 ‘가족의 파산-장수가 부른 공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냈다.
책에는 가족이 서로 ‘짐’이 되는 다양한 사례가 실려 있다. 일은커녕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흔이 넘어서도 일해야 하는 부모들은 외부에 파산 직전의 상황을 알리기를 꺼리다 파국을 맞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혼자 모시던 60대 아들이 중증간염을 앓다 사망하고, 아들을 찾아 거실로 기어 나온 노모는 저체온증으로 복도에서 죽는 비극이 벌어지고 자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터에 나간 사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택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40%, 2,00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서 가구당 평균 소득은 1996년 6,640만원에서 2013년 5,290만원으로 급감했다. 앞으로 연금으로 생활할 부모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녀의 조합이 더욱 증가하고 친자파산에 빠질 수 있는 가족은 구조적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전직하는 사람도 연간 10만명에 이른다.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책에서는 파산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파악해 친자파산이 현실화되기 전에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제 기능을 해줘야 할 것이 정부나 지자체 이외에 지역사회다. 책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도쿄 인근 삿테시의 경우 주민들이 ‘행복 도움대’를 꾸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을 돕고 이 같은 교류를 통해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대처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 특히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 자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일 것이다. 자녀의 소득을 합산해 생활보호 지원을 박탈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세대분리와 가족해체가 불가피한 탓이다.
고령화와 비정규직 증가,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12%)을 크게 웃돈다. 205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이 책에 그려진, 벼랑 끝에 선 일본 사회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