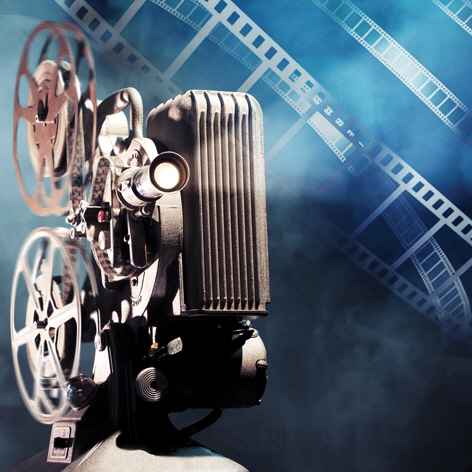1872년 미국의 사진작가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는 말이 달릴 때 두 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경마장에 24대의 카메라를 나란히 설치하고 선으로 연결해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진 ‘움직이는 말’을 찍는 데 성공했다. 이후 토머스 에디슨은 30초에 걸쳐 활동사진을 볼 수 있는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했지만 영사기라기보다 확대경 뒤로 단조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필름이 든 거대한 상자에 머물렀다. 오늘날의 영사기는 1895년 뤼미에르 형제들이 만든 시네마토그래프가 모태다. 뤼미에르 형제는 영사기를 통해 정거장에 도착하는 기차, 공장 일을 마친 노동자들의 귀가를 담은 최초의 영화를 파리 그랑카페에서 상영했다.
1999년 개봉된 영화 ‘스타워즈에피스드 1:보이지 않는 위험’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영사기를 통한 상영이었다. 에디슨 시절부터 줄곧 내려왔던 35㎜ 필름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지 루카스 감독은 “나는 필름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제 필름의 시대는 갔다”고 선언했다. 영화 ‘시네마천국’에는 어른이 된 토토가 영사기사 알프레도가 모아둔 필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어쩌면 필름 영사기가 신기술 개발로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극장들도 콘서트를 유치하고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변신에 나서고 있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도심의 새로운 문화센터로 제공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나고야 등에서는 필름 영사기를 되살려 명작의 깊은 맛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복고풍 극장도 등장하고 있다. 필름이야말로 사람의 눈에 가장 근접한 영상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영사기로 맛볼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찾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영화 역사 1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사기 없는 영화 상영시대를 열었다. 극장 전용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시네마 LED’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영화관 스크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TV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스크린이어서 별도의 영사기도 필요 없다. 첨단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정상범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