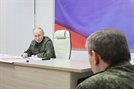1826년 런던 거리에 증기기관 자동차가 등장하자 생존에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동차 때문에 말이 놀란다거나 자동차가 도로를 망친다는 논리였다. 영국 의회는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적기조례(붉은 깃발법)라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교통법을 발표했다.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달리면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2톤 단위로 세금을 물고 시나 주 경계를 넘을 때는 반드시 도로세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번거로운 규제와 과중한 세금 탓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가 처음 선보였을 때는 이동시간을 따져 일일이 요금을 매겼다고 한다. 별도의 거리측정 방식이 없어 시계를 걸어두고 이동에 걸린 시간으로 계산했다. 바퀴의 회전속도로 거리를 측정하는 택시 미터가 개발된 후에야 요금체계가 거리 단위로 바뀌었다. 마차나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은 예로부터 가장 손쉬운 세금부과 대상이었다. 택시(taxi)라는 말도 평가하거나 부담을 지울 때 사용하는 라틴어 ‘탁사(taxa)’에서 유래됐고 세금을 의미하는 ‘tax’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애덤 스미스는 부자들의 마차에 통행세를 더 걷어 화물 수송을 값싸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세를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긴다. 일부 나라는 엔진 출력과 무게도 따진다. 낡을수록 매연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미국에서 ‘마일세(miles fee)’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휘발유세에 의존해온 도로 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로 주행거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매기겠다는 욕심은 변하지 않는 듯하다. /정상범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