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월19일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던 김구는 비장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수차례의 회담을 거쳐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까지 도출했지만 끝내 분단만은 막아내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단독선거가 정해지고 김일성 체제가 북한에서 굳어진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다시 70년이 흘러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회담에 앞서 우리 예술단은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평양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봄이 온다(평양공연)’를 잘했으니까 가을에는 남측에서 ‘가을이 왔다’(서울 공연)를 합시다.” 정말 올가을께 열매가 맺어질까.
4월의 한반도는 70년 전과 오늘 닮은 부분이 있다. 중요한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 헌법을 둘러싸고 정치집단 사이에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선거에 대한 저항이 컸고 올해는 6·13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헌법을 둘러싸고도 1948년 제헌 때 국회의 ‘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제’가 맞섰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임 대통령제’ 개정안에 야당의 반발이 크다.
반면 남북대화 기류만 보자면 그때와 지금이 썩 다르다. 70년 전 4월 김구의 평양행은 고독했다. 자파의 김규식조차도 망설이다 뒤늦게 동참할 정도였다. 더욱이 미국의 반대는 너무도 확고했다. 그에 반해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나 자신과 김정은 사이의 회담들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회담이) 아주 멋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행보는 묘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고도 없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해 극진히 대접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중국의 태도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당장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 써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시기하는 일본에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입각할 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 대화 기류에 흠집을 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맞아 자위대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며 ‘제2의 유신’을 꾀하고 있는 일본이다. 1868년 일왕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한반도 침략과 무차별 살상을 자행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한시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얄궂게도 국제사회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돌연 냉기류에 휩싸였다. 미국·영국·프랑스와 러시아·중국·이란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더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시리아 공습이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 파기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아니라고 믿지만 혹여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그런 속내가 있다면 우리는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대화가 아닌 대결의 결과는 언제나 참혹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돌이켜보면 1948년 남북협상의 와중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4월에는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미소 간 냉전이 고조됐고 5월에는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에 맞선 아랍연맹의 선전포고로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하지만 소련의 일방주의는 결국 훗날 국가 해체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처럼 역사는 유사함과 상이함 속에 흘러왔으며 지금 우리는 70년 전과 닮은 듯 다른 남북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화로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 후대를 위해 어떤 역사주체로 남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는 4월이다. hns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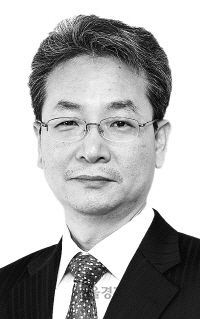
 hnsj@sedaily.com
hns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