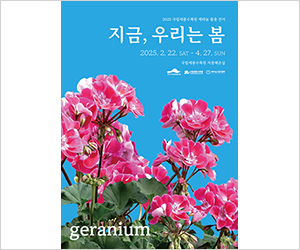지금으로부터 꼭 23년 전인 1995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철거 임박한 한옥 건물과 주변에서 전시가 열렸다. ‘싹’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훗날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가 된 김선정 큐레이터의 국내 첫 기획전으로 한국 미술가 17명의 설치작업을 선보인 자리였다. 작가 이불이 스팽글 수십 개가 박힌 날생선을 유리 박스 안에 넣어 선보인 ‘장엄한 광채’는 여름날 생선 썩는 냄새로 동네를 뒤흔들었다. 작가 최정화는 음식물 사진으로 꾸며진 플라스틱 변기 커버들을 대청마루에 놓았고, 박모(박이소)는 세모·네모·원의 기하학적 기본형태를 새긴 돌 테이블을 제작해 ‘세잔느의 무게’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다. 윤석남·육근병·안규철·공성훈·오형근·홍성민·이동기 등 당시 ‘젊은’ 작가로 분류되던 참여작가들은 모조리 한국 현대미술계의 거물이 됐다. 미술관 같지 않은 전시공간에서 작품 같지 않은 설치작업들을 보여준 ‘충격적 전시’에 대해 평단에서는 “희한한 전시”라거나 “퇴행적 전시”라는 혹평도 내놓았지만 이는 이후 들어설 아트선재센터의 싹수, 즉 그 정체성을 예고한 것이었다.
한옥이 허물어진 자리에 3년 뒤 세워진 대우재단 소속의 사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는 1998년 7월9일 개관전 ‘반향’과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아트선재센터는 1995년의 ‘싹’ 전을 시작으로 20년사를 엮어 ‘커넥트:아트선재센터 1995-2016’을 출간했다. 지난 19일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미술사학자 우정아 포항공대 교수, 작가 김홍석 상명대 교수, 박활성 워크룸 편집장 등이 참석해 아트선재센터의 역사를 되짚었다.
야요이 쿠사마, 토비아스 레베르거, 마틴 크리드 등 해외작가는 물론이고 김범·김성환·김홍석·백승우·서도호·양혜규·오인환·이주요·임민욱·정서영·주재환·황규태 등 쟁쟁한 작가들이 이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아트선재센터 인근 미술기관과 서울역, 옛 기무사(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을 아우른 ‘플랫폼 서울’(2006~2010년)은 고정된 장소를 벗어나 ‘열린 공간성’을 추구한 축제형 미술행사였다. 비무장지대(DMZ)와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례전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는 경계를 파고들어 그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아트선재센터의 정체성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빛을 발했다.
우정아 교수는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적 경험을 넓혀가던 시기 아트선재센터가 미친 영향을 동시대성과 장소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화두로 던진 1995년은 100주년 맞은 베니스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생기고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시작된 해로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우 교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양분되는 대치상황에서 벗어난 신세대 작가들이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삶, 포스트모더니즘, 상품미학 등을 받아들여 탈정치성을 표방한 시기였다”면서 “당시 김선정 큐레이터가 ‘겉은 한옥인데 일본식 구조가 가미된 서양식 건물인 이 집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 정의처럼 압축적 근대화 속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대의 뒤틀린 틈 속에서 아트선재센터가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미술관은 화이트큐브’라는 고정관념을 깨며 최첨단의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역할로 아트선재센터는 강렬한 족적을 남겼다. 김선정 대표는 “개관 당시 미술관이라는 명칭보다 ‘센터’를 사용한 것은 개방된 여러 가지를 실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라며 “전시보다 ‘프로젝트’로 불리는 행사들이 많은 것 역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현재 미술관을 이끌고 있는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좋은 전시를 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지금껏 그래 왔던) 미지의 시간을 계속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