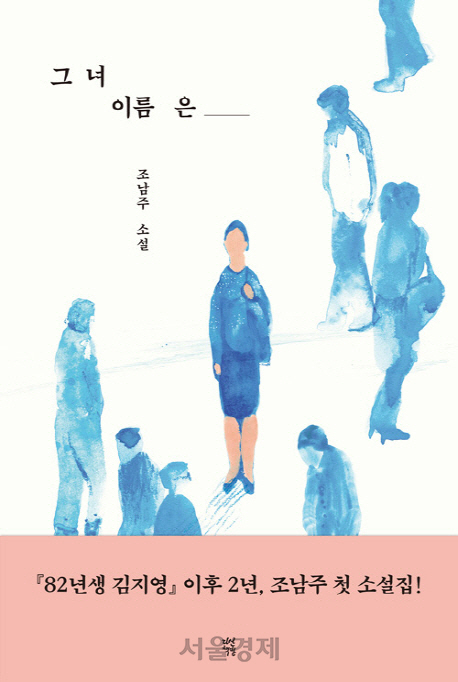‘82년생 김지영’으로 페미니즘 열풍의 중심에 선 조남주 작가가 2년 만에 신작 ‘그녀 이름은’으로 돌아왔다.
조 작가가 “김지영 씨처럼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하면서 잠을 줄여 글을 쓴다”고 서울경제신문에 신작 출간에 즈음한 소회를 밝혀왔듯이 이 책에도 여러 명의 ‘김지영 씨’가 등장한다. 부조리한 노동 환경 속에 위태롭게 놓인 2030 여성들, 결혼이라는 제도 중심과 언저리에서 고민하는 여성들, 제 이름도 잊은 채 가사·양육 노동이나 직장 노동, 때론 둘 다를 오랜 시간 떠맡아온 중년 이상의 여성들 등 이 땅의 여성들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많은 ‘김지영 씨’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 작가가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니’라고 여겨져 온 여성들의 삶을 더 많이 기록하기 위해 아홉 살부터 예순아홉 살까지 60여 명의 여성들을 직접 인터뷰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부터 1년간 한 일간지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르포 기사는 28편의 짧은 소설로 재구성돼 나왔다.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에서처럼 특유의 건조한 화법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체는 담담하지만 그 문장들의 행간에는 분명 분노가 서려 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여성이라면 함께 공감하고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저 절망만 하고 있지 않는다. 사내 성희롱 문제에 휘말렸을 때 ‘조용히 덮고 넘어간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것’(두 번째 사람)이라며 끝까지 버텨내기로 다짐하며, 결혼을 준비하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가 되지 말 것.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결혼일기)을 잊지 않기로 한다. 또 ‘나는 강하다. 우리는 연결될 수록 더 강하다’(다시 만난 세계)라며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
조 작가는 “쓰는 과정보다 듣는 과정이 더 즐겁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다”며 “인상적인 것은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해줄 말이 없는데’ ‘내가 겪은 일은 별일도 아닌데’라며 덤덤히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